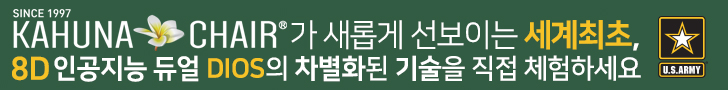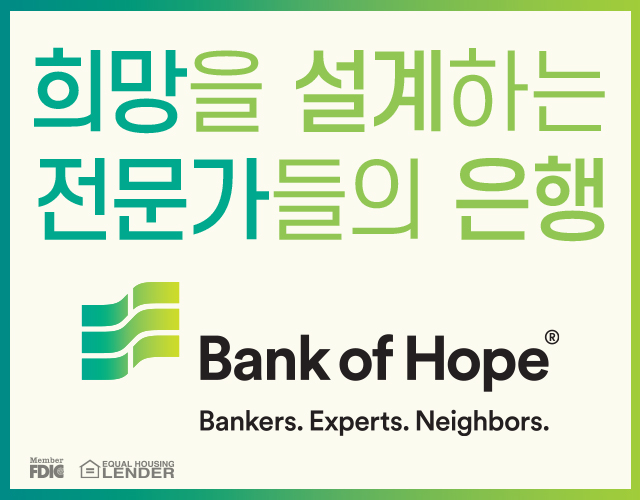K팝 산업의 어두운 이면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하이브와 어도어(ADOR), 민희진, 그리고 뉴진스 멤버들 사이에서 벌어진 내홍이 한 아이돌 그룹의 운명 뿐 아니라 K팝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 멤버들의 행태는 법과 계약의 질서를 무시한 채, 감정과 여론에 기대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일방적 ‘깽판’의 연속이다.
피프티피프티 사태가 떠오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멤버들은 소속사와 제작자 간의 갈등을 빌미로 독립을 시도했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 법원은 그들의 계약 파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중의 신뢰도 잃은 채 활동은 중단됐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뉴진스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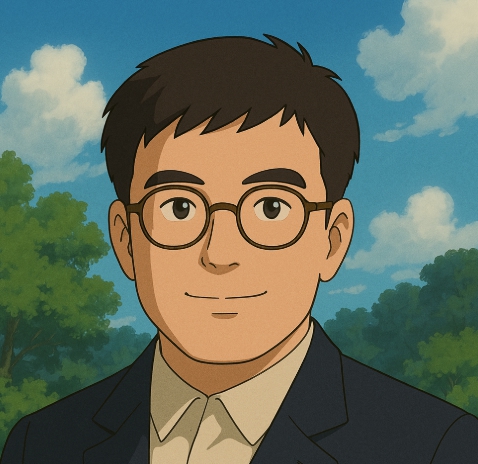
이미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민희진 역시 ADOR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이쯤 되면 상황은 명확하다. 법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이며, 민희진은 더 이상 그들의 대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멤버들은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정당한 권리 주장’이 아니다.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시스템 부정이다.
문제는 이 어리석은 오판이 단지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K팝은 법적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거대한 산업이다. 계약과 책임, 권한과 의무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뉴진스 멤버들과 민희진은 이 기본 원칙을 부정한 채, 감정적 연대와 ‘브랜드 창조자’라는 허울로 모든 걸 덮으려 하고 있다.
민희진은 자신이 뉴진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은 K팝 시스템 안에서의 ‘역할’일 뿐이다. 뉴진스는 하이브의 자회사 ADOR 소속이며, 하이브의 자금과 인프라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던 프로젝트다. 크리에이터가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소유권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원리를 부정하는 순간, 크리에이티브는 권리 주장이 아니라 반역이 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팬덤의 분열과 산업 전반의 불신이다. 피프티피프티 때도 그랬듯, 이번에도 팬들은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내부 문건과 익명 보도에 휘둘리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한 가지는 있다. 법이 판단했다는 점이다. 법원이 계약을 인정했는데도 복귀를 거부하고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것은, 산업 자체의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된다.
뉴진스 멤버들은 아직 어린 아티스트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판단은 결코 ‘어린 실수’로 덮을 수 없는 무게를 지닌다. 이는 자신들의 미래는 물론, 이후 수많은 후배 아티스트들의 가능성마저도 위협하는 선택이다. 팬들의 지지는 소중하지만, 그것이 계약을 무력화시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K팝 산업은 지금 다시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희진과 뉴진스 멤버들이 보여준 행태는 그 어떤 정당성도, 미래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K팝을 위한 진보가 아니라, 그 근간을 뒤흔드는 퇴보일 뿐이다.
K팝 시스템의 구조적 병폐
피프티피프티든 뉴진스든, 그 중심엔 ‘K팝 시스템’이 있다. 한국 아이돌 산업은 기획사 중심, 투자자 중심 구조로 움직이며, 창의성이나 아티스트의 주체성은 종종 그 뒤로 밀려난다. 그러다 보니 성공 이후 반드시 불거지는 것이 ‘누가 주인인가’의 싸움이다.
이 구조는 당장은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갈등이 터질 때마다 브랜드는 손상되고, 팬덤은 갈라지며, 결국 그 피해는 아티스트와 대중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누구의 K팝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다
피프티피프티 사태와 뉴진스 사태는 서로 다른 스케일과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K팝에서 진짜 주체는 누구인가? 기획자인가, 투자자인가, 아티스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다면 또 다른 ‘제3의 사태’는 반복될 수 있다.
<김상목 Knews LA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