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가 밝았지만 뭔가 심란하고 을씨년스럽다. ‘을씨년스럽다’는 말은 그 어감부터 뭔지 모르게 스산함을 느끼게 한다. 사전적으로는 ‘날씨나 분위기 등이 몹시 스산하거나 쓸쓸할 때 쓴다’고 되어있다.
을사년(乙巳年)에 나라에 상서롭지 않은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상심한 사람들이 ‘을사년스럽다’고 표현한 말에서 ‘을씨년스럽다’가 비롯됐다고 한다. 이는 엄청난 자연재해나 외적의 침략 혹은 위정자의 실정 등으로 인한 그 고통과 치욕이 결국에는 오롯이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돌아오는 피해를 말함이다.
120년 전 1905년 을사년(乙巳年), 일제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하고 식민지 병합의 길로 들어서면서 충신열사들의 자결 순국이 이어졌고 국민들은 침통하고 참담한 분위기에 빠졌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는 수치심, 빼앗긴 자존심, 민족의 고통의 그 비극은 단순히 역사책 속에 갇혀 있는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한국인 마음 속에 지워질 수 없는 큰 상흔으로 남았다.
120년이 흘러 다시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왔다. 하지만 조기(弔旗)를 게양한 채 이 해를 맞이할 줄은 몰랐다. 비상계엄과 연이은 탄핵 후폭풍으로 길잃은 정국 속에서 충격적이고 가슴아픈 공항 여객기 참사로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을씨년스러운 새해를 시작하면서 희생자들을 위한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올 을사년도 전처럼 ‘을사년스러울 것’이라는 법도 없다. 비록 시작은 그렇다고 해도 다행히 푸른뱀(靑蛇)의 기운으로 희망과 역동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도 있어서다.
더욱이 지난 크리스마스 전야,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5년 희년(禧年)의 시작을 알렸다. 희년은 교회가 신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성스러운 해’다.
창세기에 하느님은 엿새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7일째날 쉬셨다. 이는 제7일이 모든 노동과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나 몸도 마음도 쉬게하라는 안식일의 시작으로 제7년은 안식년, 그리고 그 안식년이 일곱 번인 49년의 이듬해인 제50년이 바로 희년이다.
이러한 성경적 맥락에서 유래된 희년은 모든 부채를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며 경작하던 땅을 쉬게하는 등 사회적 평등과 회복을 상징하는 해를 뜻한다. 억압받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해방과 회복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개신교는 희년을 제도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희년이 담고 있는 이러한 해방, 회복, 정의의 정신을 신학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실천해 형식보다는 개인과 공동체의 자발적 적용에 중점을 두는 반면 가톨릭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희년’을 선포하고, 성문(聖門: Holy Door)을 여는 의식을 포함한 다양한 전례와 행사를 통해 희년을 지킨다.
해서 1300년부터 50년마다 희년을 기념하기 시작하던 것을 후에 모든 세대가 최소한 한 번 희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5년 주기로 줄였다.
한강 작가는 최근 노벨문학상 시상식 강연에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고 물은 바 있다. 역사는 돌이킬 수 없지만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를 일구어 가는 것일 게고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만큼 을씨년스러운 기운을 이겨내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이다.
아픔의 기억을 잊지 않되 그 기억을 통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겨야 하는 의무이고 보면 비극과 암울함의 을사년 기시감을 회복과 기쁨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을씨년스럽다’가 아닌 ‘을씨년답다’가 되도록 올 새해가 그 희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상처가 희년의 은혜로 아물길 바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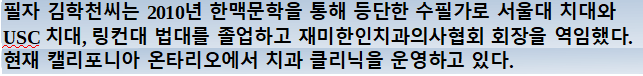
이전 칼럼 [김학천 타임스케치] 숲속의 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