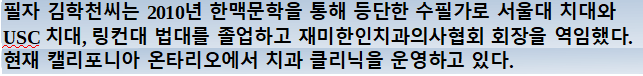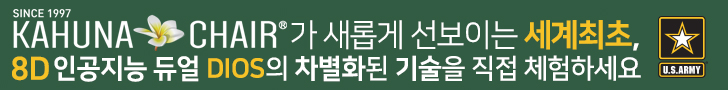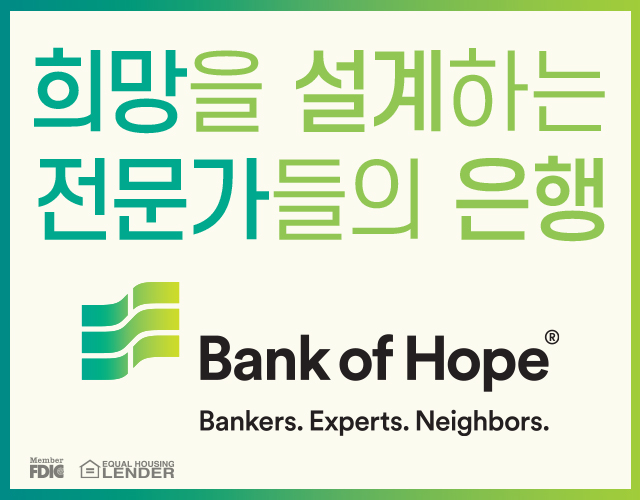‘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세계사는 크게 바뀌었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철학자 파스칼의 말이다. 역사에서 가정법은 부질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종종 ‘만약에 이랬었다면 혹은 안 그랬었다면’하며 궁금해하거나 아쉬워하기도 한다.
좁게는 만일 우리 부모가 천생연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라든가 우리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혹은 내가 그 때 다른 직업을 택했더라면 등 아쉬운 과거를 바꾸어보면 불만족스런 현재의 모습도 훨씬 달라져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어렵고 위태로워던 과거를 극복한 현재의 모습이 대견하거나 다행일 수도 있다. 이처럼 이미 완료된 역사에 ‘만약에’라는 가정으로 생각해 보는 일은 흥미로운 일 일게다.
개인사가 그러하듯 범인류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만일 남북전쟁에서 남부가 이겼다면이라든가, 케네디가 암살되지 않았다면 등 완료된 현재 역사와 다르게 상상해 보기도 한다. 작가들은 이러한 가정을 전제로 역사를 재구성해 작품을 쓰는데 ‘만약에 이러이러하다면(What-if)’ 형식의 대체문학이 바로 그것이다.
필립 K 딕은 소설 ‘높은 성의 사내’를 통해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해 독일과 일본에게 분할 점령 당해 살아가는 1960년대 피지배자 미국인들의 암울한 일상을 그렸다.
그리고 이를 참고해 소설가 복거일은 ‘비명을 찾아서’ 소설에서 안중근 의사가 쏜 총탄에 이토 히로부미가 죽지않고 살아남아 조선이 일제로부터의 독립하지 못한 채 우리 고유의 언어와 역사는 물론 제 이름마저 상실한 채 일본의 한 지역으로 이어져 살아가는 1987년의 경성의 모습을 그리기도 했다. 가정법 역사물이라고는 하지만 자유와 독립이 얼마나 중요하며 힘들게 얻어지는 것인 지를 뼈저리게 가르치고 있다.
헌데 때 아닌 ‘역사 가정법’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프랑스 정치인이 187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에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고 한 거다. 휴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미국이 ‘자유의 여신상이 담고 있는 자유의 가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이에 백악관은 ‘절대 돌려보낼 생각이 없다’며 ‘지금 프랑스 사람들이 독일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 덕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번엔 ‘프랑스가 미국 독립을 돕지 않았으면 미국은 여전히 영국의 식민지일 것’이라고 비아냥대었다. 유치한 설전같아 보인다.
이처럼 ‘크레오파트라의 코’ 이야기같은 역사의 만약은 부질없다. 단지 되돌아보는 교훈과 반성이 있을 뿐이다. 허나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만일’은 의미가 있을 게다.
영국인이 가장 좋아한다는 러디어드 키플링의 ‘만약에(If)’란 시가 있다. 12살난 아들을 위해 험한 세상의 길잡이가 될 조언을 담아낸 시다.
‘모든 사람이 너를 비난한다 해도/ 냉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모두가 너를 의심할 때 자신을 믿고/ 그들의 의심마저 감싸 안을 수 있다면’으로 시작하는 이 시의 중간에 나오는 ‘승리와 좌절을 만나고도/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대할 수 있다면’은 유명 인사들이 음미하는 구절이라고 한다.
자유의 여신상 받침대에는 ‘나에게 오라. 너희 지치고, 가난하고/ 자유롭게 숨쉬기를 갈망하는/ 버림받은 비참한 이들이여’라는 시구가 적혀 있다. 이는 키플링이 ‘누가 이기고 지든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때 결국엔 ‘세상을 다 품은 진정한 한 남자로 성장한 것’ 이라고 했듯 세상에서 낙오된 모두를 감싸안음으로써 참다운 자유국이 되리라는 긍지를 만천 하에 공표한 것일 터. 여신상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