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만을 변호하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필자는 대부분의 일하는 시간을 합의금을 줄이는데 쓴다. 아니 소송 변호사가 멋있게 법정에서 클라이언트를 변호해서 재판을 이겨야지 무슨 사업가 처럼 돈 깎는데 집중하냐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 피고인 고용주는 법원에서 단 1달러를 원고인 종업원에게 주라고 판결을 내려고 원고의 변호사는 수십만 달러의 변호사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법이다. 이를 모르는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남한산성에 서 인조가 그랬듯이 재판 끝까지 싸우겠다고 무모한 전략을 세운다.
그러나 이성적인 제대로된 변호사는 클라이 언트에게 중재를 통해 합의를 보는 것이 경제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재판에 가서 이길 수 있다고 피고를 유혹하는 변호사는 자기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이다.

그런 이유로 필자는 거의 매주 중재를 한다.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평생에 한번 소송을 당할 까 말까 하기 때문에 중재에 참석하면 매우 당황한다. 얼마를 합의금으로 제안할 지에 서부터 얼마에 합의할 지 여부까지 생전 처음 내려야 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차 딜러에서 차를 사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해도 힘들다. 최소한 3-5시간 동안 쉴 사이 없이 액수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본인이 괜찮다고 변호사에게 오케이를 해도 나중에 너무 많이 지불하는 것이 아닌 지 여부를 놓고 복기를 하면서 맘이 바뀔 수 있다. 더구나 나중에 가족 들과 이야기를 하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중재할 때 미리 MOU나 합의문에 사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중재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가족들은 합의금 액수가 왜 그렇게 도출됐는지를 이해하기 힘든데도 나중에 변호사를 쉽게 비난하기 일수다.
트럼프의 베스트셀러 ‘협상의 기술’(The Art of the Deal) 에서 네번째 전술은 “시장을 알라”, “현장을 직접 파악하라”이다. 전문가나 다른 사람의 조언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현장에 나가 서 가능성을 따져보라는 것이다. 중재를 할 때 본인도 중재장에 참석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한인 고용주들이 대부분이다. 모든 것은 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현실을 매우 어려워 한다. 그런데 얼마에 합의할 지 여부는 변호사가 대신 결정해 줄 수 없다. 이 책에서 아홉번째 전술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이다.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이든 약속만 하고 주목을 받은 후에 그냥 넘어가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알아챈다는 것이다. 한국이 트럼프와 거래를 해야 한다면 먼저 그 가 구사하는 ‘협상의 기술’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래야 그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고 한국의 입장과 국익을 지킬 수 있다.
트럼프의 이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3,500억 달러 협상안에 서명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은 중재장에서 합의만 하고 집에서 가서 딴 소리를 하는 일부 클라이언트들과 비슷하다. 3,500억 달러를 백악관에서 수용하고 1,500억 달러 기업투자에 보잉기 50대, 알래스카산 에너지 1,000억 달러 어치 구매 약속까지 했지만 합의문 조차 없는 회담을 고려시대 서희의 담판에 비유하고 있다.
“국익에 해로우니 서명을 못한다”거나 “감당할 수준은 연 200-300억 달러”라는 변명은 트럼프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내세웠어야 한다. 3,500억 달러를 넘게 주겠다고 약속한 뒤에 “사실은 돈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상식도 아니고 성숙한 국가 원수의 자세가 아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업주가 그래도 비난을 받는데 10대 경제대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양아치처럼 약속을 안 지키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영어가 난무 (?)하고 상대방 변호사와 중재 변호사가 있는 중재판에서 한 약속을 집에서 가서 마누라에게 야단을 맞고 말을 바꾸는 것처럼 백악관에서 약속한 것을 한국으로 돌아가서 용감하게 보이기 위해 딴 말을 하는 것은 “방구석 여포”에 불구하지 참다운 리더십이 아닌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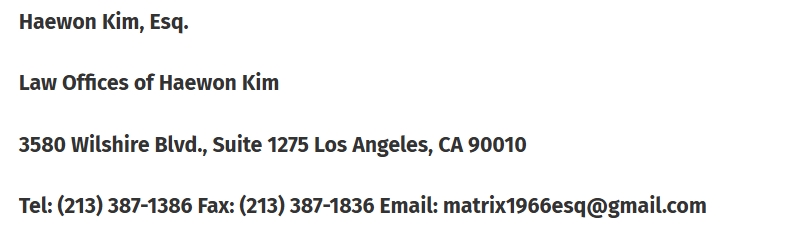
이전 칼럼 [김해원의 식도락법(13)] 스시뉴스 LA 창간 1주년을 맞아
이전 칼럼 [김해원의 식도락법(12)] 카멜 커피와 롯데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