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제나 이맘 때면 이브 몽땅의 샹송 ‘고엽’이 흘러나오는 계절, 스잔한 가을임을 느끼게 되지만 우리에게는 더 정답게 다가오는 노래가 있다. ‘명동의 엘레지’ 혹은 ‘명동의 샹송’이라고 하는 박인환 시 ‘세월이 가면’이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전후 당시 명동은 많은 문인과 예술가들이 드나들던 곳으로 주로 술집에서는 음주와 함께 문학담론이나 철학을 논한데 반해 다방은 보다 격조 높은 문학공간이었다. 술집 은성과 유명옥 그리고 다방 모나리자와 동방쌀롱, 청동다방, 포엠 등이 주요 무대였다.
그 중에서 ‘명동백작’으로도 불렸던 키가 크고 멋쟁이였던 시인 박인환. 그는 피난시절 대구의 음악다방 ‘포엠’의 여주인을 사랑했다. ‘입술이 여리고 눈이 큰 여인’이었다고 한다. 헌데 그녀에게는 끊임없이 구애하는 청년이 있었다. 여인이 이를 모른채 꿈쩍도 않자 청년은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그녀는 그에게로 갔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남대문 시장에서 아이를 등에 업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된다. 대구 포엠의 그 여자였다. 아이 아빠가 전쟁에서 죽었다고 말하는 그녀의 손에는 그의 시집 ‘목마와 숙녀’가 들려 있었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 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 별이 떨어진다/…/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왜 우리는 떠나야 하나’고 탄식하던 박인환.
얼마 뒤 그는 자주가던 명동 술집에서 가수와 작곡가와 자리를 함께 했다. 대구 ‘포엠’의 그녀를 생각하며 떠오른 시 한 수를 지어 건넸다. 즉석에서 곡이 만들어졌고 바로 가수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술집 밖으로 퍼져나간 노래소리에 지나가던 행인들도 모여들었다. 시 노래 ‘세월이 가면’의 전설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리고 1 주일 뒤 박인환은 블과 29살의 짧은 생을 마치고 저세상으로 떠났다. 마치 두 편의 시가 예고라도 한 것처럼. 해서 그랬나? 신경림은 박인환을 ‘근원을 알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의 시인이라고 표현했다.
전쟁을 겪으면서 허무주의적 감상이 짙어져서였을까? 그 때문에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시름하고 ‘나뭇잎에 덮여 사랑이 사라져도 좋다’고 한숨지었는 지도 모르겠다.
그럴수록 감성에 더욱 예민했던 그였던 만큼 ‘그 사람의 이름보다는 눈동자와 입술의 기억이 더 아련히 가슴에 남아 있다’고 했는가 보다. 마치 ‘한 여자보다 한 여자의 연애를 그리워하였다’고 했던 어느 시인의 말처럼 머리의 기억보다는 마음에 남겨진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는 다시금 찾아오는 그 사랑의 그림자를 곱씹어보고 그리움에 눈물 지으며 ‘가을은 나로 하여금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사람으로 한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가을이 가고나면 ‘눈물의 눈동자’는 다시 가슴에 남게 되겠지만 그는 되뇌인다. ‘가을은 또 다시 오는 것’ (박인환의 ‘가을의 유혹’)
그의 긴 한숨과 깊은 시름이 우리의 가슴을 시리게 하고 저리게 하는 이 가을이 점점 깊어만 간다. 그래도 ‘가을은 또 오는 것!’ 나도 되뇌여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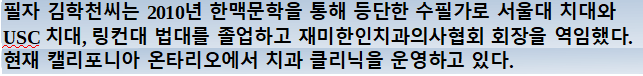 이전칼럼 [영상 에세이]세기의 연인이 부르는 고엽(枯葉)
이전칼럼 [영상 에세이]세기의 연인이 부르는 고엽(枯葉)
이전칼럼 [김학천 타임스케치] 트럼프 당선과 로이 콘의 그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