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4년 3월13일 새벽, 뉴욕시 퀸스의 아파트 단지에서 성폭행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는 키티 제노비스(Kitty Genovese)라는 여성이었다. 새벽에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그녀가 범행을 당할 당시 아파트 동네 사람들 중 누군가가 ‘그 여자를 내버려 두라’고 소리지르자 범인은 도망쳤다.
1964년 3월13일 새벽, 뉴욕시 퀸스의 아파트 단지에서 성폭행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는 키티 제노비스(Kitty Genovese)라는 여성이었다. 새벽에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그녀가 범행을 당할 당시 아파트 동네 사람들 중 누군가가 ‘그 여자를 내버려 두라’고 소리지르자 범인은 도망쳤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돌아와 움직이기 힘들어 쓰러져있던 그녀를 또 난자했다. 제노비스가 계속 지르는 소리에 아파트에 불이 다시 켜지자 범인은 또 도망 갔다. 제노비스가 힘겹게 집을 찾아 아파트 복도로 갔을 때 범인은 다시 나타나 성폭행했다. 얼마후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녀는 이미 숨진 뒤였다.
처음에 이 사건은 뉴욕 타임즈에 단 몇줄의 짧은 기사로 실렸다. 그러나 나중에 사건이 일어나는 약 35분 동안이나 집에 불을 켜고 그녀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38명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수정되어 보도됐다. 많은 사람들이 범행을 목격했으나 아무도 피해자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미국 사회는 경악했다.
그러다가 사건 발생 무려 52년 후인 2016년, 키티 제노비스의 남동생이 이를 추적 조사하고 뉴욕타임즈 기자의 왜곡 보도로 인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6명, 그 중 2명은 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결국 뉴욕타임즈는 오보를 인정하는 기사를 낼 수 밖에 없었다.
헌데 여기서 처음 보도에 접한 사회심리학자 존 달리(John Darley)와 빕 라테인(Bibb Latané)은 ‘왜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라는 의문을 품고 심리 실험을 해 보았다. 학생들이 모여 토론하는 방에서 한 학생이 갑자기 경련으로 쓰러졌을 때 참가자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실험이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방에 한 사람만 있을 때는 그를 도와줄 확률이 85%였던 데 비해 5명이 있을 때는 고작 31%에 불과했던 거다. 즉, 사람들이 집단으로 있을 때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하는 심리가 작용하며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희석되기때문이라는 거였다. 두 사람은 이를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라고 이름 붙였다. 일명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도 한다.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 13일 밤 제노비스 사건과 같은 일이 필라델피아 교외 통근열차 안에서 일어났다. 노숙인 남성이 한 여성을 성폭행 한 것이다. 열차 안에는 승객들이 있었지만 약 8분간이나 여성이 공격당하는 데도 아무도 나서지도 않았다. 심지어 일부 승객은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방관자들을 스스로 단죄한 사건도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2001년 중국계 미국인 감독이 제작한 ‘버스 44’라는 11분짜리 단편영화가 그것이다. 중국 시골에서 여성운전사가 모는 버스에 어느 지점에선가 두 남자가 올라탄다. 헌데 갑자기 그들은 강도로 돌변하더니 승객들을 위협하고 돈을 갈취한다.
그리고는 강도들은 차에서 내리면서 여성운전사를 길가 풀속으로 끌고가 성폭행한다. 버스 안의 승객들이 모두 외면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한 남성만이 강도들의 악행을 제지하려했지만 역부족으로 폭행당하고 칼로 상처까지 입은 채 쓰러진다.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그 운전사는 오히려 강도들을 제지하려던 남성을 강제로 내리게 하고는 다시 가던길로 출발한다. 홀로 남은 그는 간신히 다른 차에 편승해 지나다가 참혹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다. 바로 그가 탔던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 경찰은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전해 준다. 여성 운전사가 그 남성만 내려놓고 모두 죽음으로 몰고 가 복수를 한 셈이다. 그녀가 성폭행당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승객들은 과연 죽어야할 죄인이었을까?
여러사람이 한 사건을 같이 목격할 때 개입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누군가 나서겠지 생각하며 굳이 자신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인데 이를 정신분석학자들은 ‘책임분산’이라고 말한다.
독일의 심리학자 ‘막스 링겔만(Max Ringelmann)’이 연구한 줄다리기 실험을 보자. 개인의 힘을 100이라 했을때 두 명이 끌 때는 개인의 힘을 93%, 세 명일때는 85%, 여덟 명일때는 64%밖에 쓰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사람수가 많아질 수록 힘에 대한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다.

이러한 방관자 효과 문제에 대해 암허스트 대학교 심리학 교수 캐서린 샌더슨(Catherine Sanderson)은 다양한 사례와 심리학 연구 및 실험을 통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왜 소수의 사람만 타인을 돕고, 그 외의 사람들은 침묵하는지’를 분석하고 ‘방관자 효과 – 당신이 침묵의 방관자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나비효과’라는 책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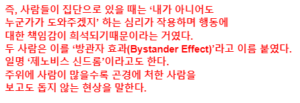 여기서 그녀는 흔히 사람들이 중대 범죄는 특별한 악인만의 전유물이라고 여기는 판단은 불행하게도 옳지 않다고 말한다. 수많은 범죄와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행위가 다수에 의해 쉽게 무시되거나 간과되었기 때문이란 거다. 결국 ‘나쁜 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에는 악인들의 개인적 결정이 아닌, 다수의 선한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고 나서서 행동하지 않은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그녀는 흔히 사람들이 중대 범죄는 특별한 악인만의 전유물이라고 여기는 판단은 불행하게도 옳지 않다고 말한다. 수많은 범죄와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행위가 다수에 의해 쉽게 무시되거나 간과되었기 때문이란 거다. 결국 ‘나쁜 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에는 악인들의 개인적 결정이 아닌, 다수의 선한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고 나서서 행동하지 않은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위 사람들의 위험을 외면하는 현상은 기존 ‘제노비스 신드롬’과는 결이 다르다고 분석한다. 이는 ‘내가 어쩌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과 함께 보복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더 나아가 오히려 구조받은 사람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공받을 수도 있음을 말한다. 말하자면 ‘도와주고 누명쓰기’다.
이러한 현상은 남의 일에 나섰다가 오히려 피의자로 몰리는 등 곤경에 처하는 모습들을 언론보도를 통해 얻어진 ‘학습’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과거의 제노비스 신드롬처럼 ‘나 말고 누군가 도와주겠지’하는 수세적인 방관이 아니라 ‘학습된 외면’이란 거다.
이 때문에 타인의 곤경을 외면하는 풍조를 ‘법으로라도 강제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만든 것이 ‘착한 사마리아 법(Good Samaritan law)’이다(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당한 행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성껏 돌봤다는 성서 이야기).
이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도덕적 의무를 법적 의무로 만듦으로써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울 목적으로 한 선한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는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상황인데도 돕지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구조불이행죄’도 포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선한 행위’가 ‘처벌받지 않기 위한 행위’로 폄하되면서 사회가 더욱 삭막해 진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이 아니라 윤리교육 등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부딫칠 경우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숙제에 앞서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박사가 외쳤던 경구를 보자. ‘가장 큰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외침이 아닌,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라고 한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