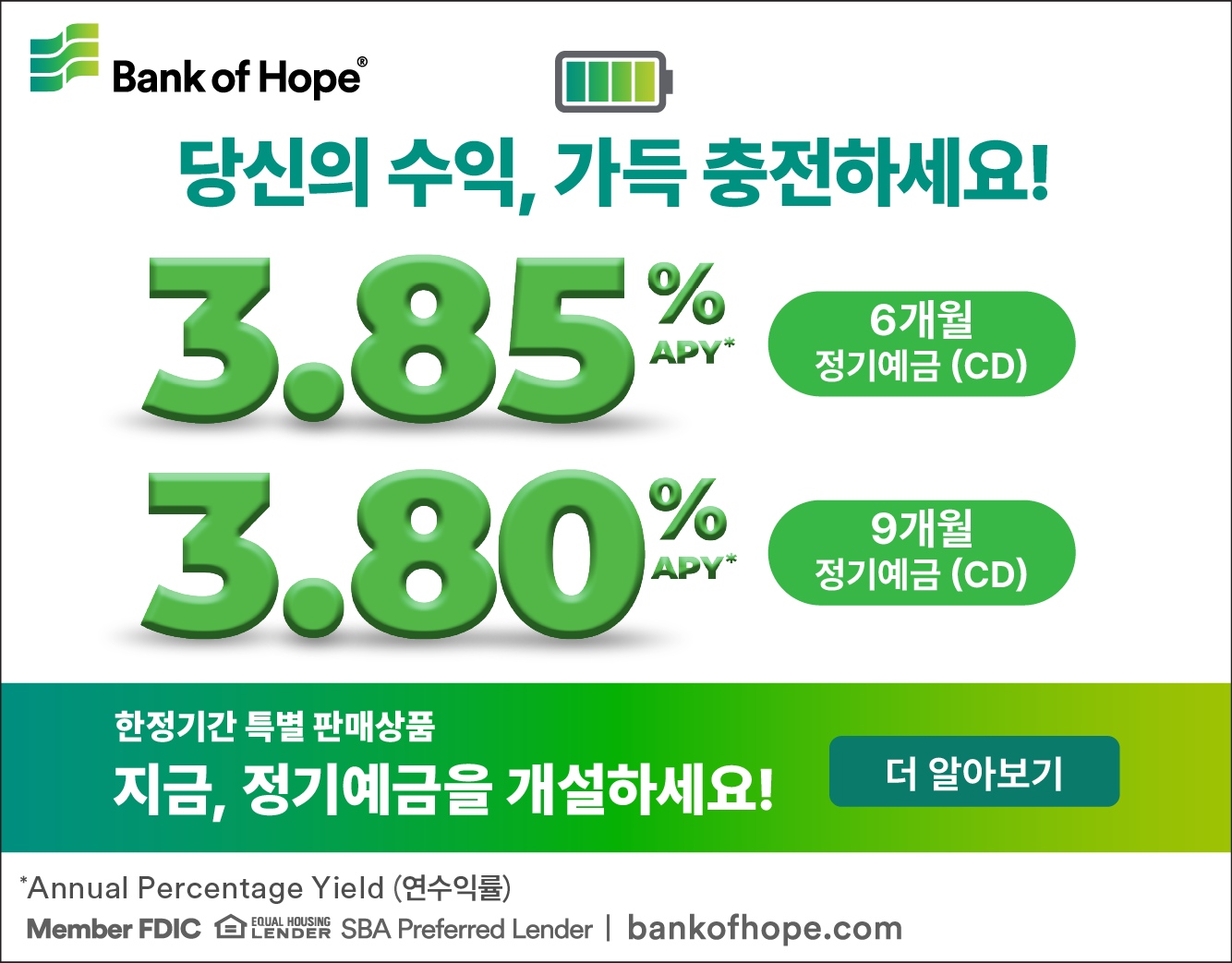웹사이트 접근성을 이유로 한 장애인 차별 소송이 최근 한인 업소들을 상대로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한인 자영업자들 사이에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인 대형 레스토랑 체인인 ‘가부키 레스토랑’이 시각장애인에 의해 피소돼 영세 한인 업소들도 같은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 장애인법(ADA)을 활용한 ‘소송 비즈니스’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한인 업소들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웹 접근성 장애인 소송’의 전형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가부키 레스토랑의 장애인 차별소송 피소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시각장애인 제니퍼 카바인이 가부키 레스토랑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언루 민권법(Unruh Act)과 연방 ADA에 근거한 장애인 차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바인은 자신이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이라며 가부키 레스토랑의 웹사이트(www.kabukirestaurants.com)를 사용할 때 스크린 리더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데, 카부키 레스토랑의 공식 웹사이트가 이 소프트웨어와 호환되지 않아 메뉴확인과 주문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카바인은 해당 웹사이트에 대체 텍스트가 누락되거나 잘못 라벨링되어 있어 화면 낭독기가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며, 웹페이지 내부에 적절한 제목 구조가 없어 정보 탐색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주문 시스템이 시각장애인을 고려해 설계되지 않아, 실제로도 매장에서 음식을 픽업할 수 있는 주문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언루 민권법'(Unruh Civil Rights Act)과 연방 장애인법(ADA)을 근거로 제기되었으며, 카바인은 법원이 해당 웹사이트가 시각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라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손해배상금, 변호사 비용, 그리고 배심 재판도 요구했다.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접근성 소송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비영어권 업주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네일숍, 마트 등이 주요 타깃으로, 웹사이트에 alt-text(대체 설명), 명확한 내비게이션 구조, 접근 가능한 주문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한다.

■ 반복되는 패턴 … 한인 업소들 잇단 피소
한인 업소들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수년간 LA와 오렌지카운티의 한인 식당, 한의원, 보험사, 부동산 업체 등이 비슷한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다. 원고 대부분은 몇 달 간 수십 곳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패턴의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이들이다.
업주들은 이러한 소송이 대부분 특정 원고가 동일한 형식으로 수십 건을 제기하는 패턴을 띠고 있으며,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소송이 시작되고, 합의금과 법적 비용을 부담하라는 압박이 뒤따른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달 플로리다에서는 한식 바베큐 체인 ‘Hallyu Korean BBQ’가 웹사이트 접근성 문제로 피소된 바 있으며, LA와 오렌지카운티 내 한인 식당, 네일숍, 부동산, 한의원 등 다양한 업종의 업소들이 동일한 유형의 민사소송에 연이어 휘말리고 있다.
이같은 ADA 디지털 접근성 소송들은 대부분 1~2명의 원고가 다수 업체를 상대로 같은 유형의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금 및 법정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한인 업주들은 “경고장 없이 바로 소송이 들어오고, 대응 비용만 수천 달러가 든다”고 호소한다.한인 업주들은 웹사이트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소송 대상이 되었고, 경고 없이 바로 소장이 날아왔다며 대응 비용이 수천 달러에 달해 운영 자체에 큰 타격이 됐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 ADA, 권리 보호인가 소송 악용인가
미국 장애인법(ADA)은 1990년 제정된 후 장애인의 공공 공간 및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웹사이트 접근성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소송 남용’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2019년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웹사이트가 오프라인 매장과 실질적으로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ADA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지만, 실제로 어떤 기술적 수준까지 요구되는지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
심지어 일부 전문 로펌은 특정 원고를 앞세워 수십 건의 소송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한 뒤, 합의금과 변호사비 명목으로 수만 달러를 받아내는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송이 장애인의 권리 보호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보다는, 법적 허점을 악용한 반복적이고 상업적인 소송으로 변질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업체의 법적 분쟁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직면한 새로운 법적 위협과 현실을 상징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애인 권리와 소상공인의 생존권 사이에서 사회가 어떤 균형을 모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상목 기자>
관련기사 [단독] 한인 여성 19년 일했는데 .. 40대 여자라 차별, 해고 주장 가부키 운영사 상대 소송
관련기사 [단독] 한인소유 일식체인 가부키, 집단소송 피소 5년째 … “휴식시간 없고, 유니폼 내 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