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게 참 문제네!’를 영역하면 뭐가 될까? 답은 간단하다.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이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게 참 문제네!’를 영역하면 뭐가 될까? 답은 간단하다.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이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Hamlet)’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우스갯소리로 만든 말이다.
하지만 이는 셰익스피어가 열한 살짜리 아들 ‘햄넷(Hamnet)’을 잃은 후 삶과 죽음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두고 고뇌하는 인간의 슬픔을 ‘햄릿’에서 승화시켜 토해낸 절규라고 한다. 그리곤 다음 말로 이어진다.
‘이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참고 견뎌내는 것이 고상한 일인가, 아니면 고난의 바다에 맞서서 무기를 집어 들고 덤벼드는 게 옳은 일인가?’라고 말이다.
결국 햄릿은 전자(前者)를 택함으로써 사색형 인간의 모델이 되었다.
헌데 햄릿이 독백한 후자(後者)는 엉뚱하게도 스페인의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가 지어 낸 ‘돈키호테(Don Quixote)’의 몫이 되어 무모하고 저돌적인 행동형으로 등장했다.
그럼에도 ‘햄릿’은 생각이 너무 많아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인물로도 비판 받는 반면 돈키호테는 무모해도 용기 있는 행동으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인간형으로 평가 받기도 한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러시아 작가 투르게네프가 나누었듯 ‘햄릿형과 돈키호테형’ 둘 중 하나이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어느 한 유형이라는 생각이 든다.
햄릿같이 선택이나 결정을 못해 우물쭈물 망설이는 ‘글쎄요 족’이든가 지나친 숙고에서 벗어난 ‘키호티즘 족’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중간 부류 족 말이다.
헌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삶의 현장엔 온통 ‘눈치형’과 ‘묻지마 형’만 있어 보인다. 정치가 그렇고, 기업이 그렇고, 소위 지도급이라는 인사들 두루두루 그렇다. 그 사이에는 금권력으로 갑질하는 미개형까지 모두가 절대적으로 믿는 신조는 단 하나, ‘뺏느냐 뺏기느냐, 아님 짓밟느냐 밟히느냐 그것만이 내 알바로다’라는 식이다.
이러한 예견에 겁나서 그랬을까? 생전에 수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던 셰익스피어는 오히려 죽으면서 남긴 말이 없다. 단지 ‘내 무덤을 파헤치지 말라. 그런 자는 저주 받을 것이니라’고 했을 뿐이라고 한다.
기이하게도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 두 사람의 인생에는 공통점이 많다.

어린 시절의 가난과 고생, 파란만장한 질곡의 삶 등이 그렇다. 1564년 잉글랜드 중부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셰익스피어는 아버지의 사업이 몰락하는 바람에 13세 때 학업을 중단한 후 숱한 고생을 거쳐 30대에 극작가로 알려져 52세에 타계할 때까지 37편의 작품을 썼다.
이보다 17년 앞서 1547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인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세르반테스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가 빚때문에 전 재산을 차압당하면서 떠돌이 신세가 되어 군에 자원 입대했다. 그러다 레판토 해전에서 왼손을 다쳐 평생 외팔이로 지내면서 갖은 고생을 했는데 대표작 돈키호테는 57세가 되어서야 빛을 봤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 대가는 공교롭게도 1616년 4월23일, 같은 날 생을 마감했다.
다만 눈감을 때 셰익스피어와 달리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 묘비명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미친 듯이 살다가 정신 들어 죽었노라’고.
이는 이성을 앞 세워 잘난 논리로 이해관계를 따지며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 아니면 우리가 꿈꾸는 것이 비록 가능치 않다 할지라도 공동의 선을 위해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 아닐는지. 숙고해야 할 무거운 숙제를 내 준 셈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를 통해서 작금의 고위급 지도자들이나 거물급 대표 인사들의 치졸하고 유치한 행태들 그리고 금수저들의 저질스런 갑질 행패에 대해 이렇게 일갈했다. ‘좋은 배경의 미천한 자들보다는 천한 혈통의 나은 사람들이 더 중시 되고 존경받아야 한다’고.
마침 지난 주말은 두 대가의 406 주기(週忌)였는데 이들의 기일(忌日)을 기리는 동시에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에서 책을 읽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던 ‘세인트 조지’ 축일에 맞추어1995년 유네스코(UNESCO)가 정한 ‘세계 책의 날’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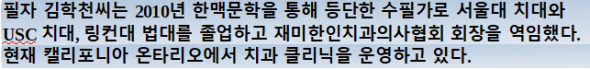
관련기사 [김학천 칼럼(47)] “나를 기억하라”: 왜 그가 죽어야 했나
관련기사 [김학천 칼럼(46)] 무한폭주 ‘개스값 혼돈’: 제자리는 언제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