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르 클레지오(Jean Le Clezio)는 8살 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제주도 해녀 기사를 처음 접하고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전복이나 문어 따위를 캐오는 여성들의 모습에서 큰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마침내 19년 후인 2007년, 제주도를 찾은 후 소설 ‘폭풍우’를 발표했는데 그 서두에 ‘제주 우도의 해녀들에게’라고 헌사했다.
프랑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르 클레지오(Jean Le Clezio)는 8살 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제주도 해녀 기사를 처음 접하고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전복이나 문어 따위를 캐오는 여성들의 모습에서 큰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마침내 19년 후인 2007년, 제주도를 찾은 후 소설 ‘폭풍우’를 발표했는데 그 서두에 ‘제주 우도의 해녀들에게’라고 헌사했다.
베트남전쟁 종군기자였던 필립은 종군기자 시절 군인들의 민간인 소녀 성폭력을 방관했다는 죄의식과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으로 삶의 의미마저 잃는 아픔을 겪는다.
그런 그가 그녀를 바다로 떠나보낸 지 30년 만에 제주 우도를 찾는다. 그리고 그 섬에서 해녀인 어머니와 살고 있는 13살 혼혈 소녀 준을 만난다. 준은 필립을 아버지처럼 사랑하게 되고 필립은 그런 준을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된다.
소설은 전쟁과 폭력을 고발하는 한편, 섬에서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지만 동시에 정화하는 바다와 폭풍우를 때론 삶으로, 때론 죽음으로 교차하며 다가오는 존재로 그린다. 그런 배경의 섬, 제주도에서 바다를 맨몸으로 드나드는 해녀들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그러고 보면 맨몸으로 바다를 드나드는 해녀의 생활 역시 삶과 죽음의 교차로에서 싸우는 전사(戰士)와 닮은 꼴인 셈이다. 그런 제주 해녀들의 삶을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은 ‘숨’ 이라 했다(‘숨, 나와 마주 서는 순간’에서).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살지만 숨을 쉬면 안 되는 사람들, 해녀들. 입으로 쉬는 숨, ‘물숨’은 금기다. 깊은 바닷속에서 숨을 참지 못해 ‘물숨’을 쉬면 자칫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다.
그럼 어떻게 쉴까? 해녀들은 바닷속에서 가슴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데 물에 들어갈 때 쉬는 숨이 있고 해산물을 잡을 때 쉬는 숨이 있으며 밖으로 나올 때 쉬는 숨이 있다고 한다. 한번 물에 들어가면 15번 정도 숨을 쉬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야 비로소 입으로 내쉬는 데 이를 ‘숨비소리’라 한단다. 휘파람 소리같은 숨비소리, ‘호오이, 호오이~!’

공기통이나 호흡기 등 없이 오직 자신의 호흡만으로 물질하는 해녀들에게 ‘숨’은 곧 목숨인 거다.
그런 해녀들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다. 해서 그들의 넋두리 또한 애닲다.
‘자식새끼 서넘이나 남겨놩/바닷귀신 되어버린 아방놈을/…/술이야 노름이야를/내나 지새끼들 보다 좋다 하던 아방놈을/…/과부년 끌끌한 눈물 배리는 놈들 흉무서웡/잠녀는 물질속에 울엄쩌/바다속에 울당 보민 눈물도 흔적어시/자식새끼 먹여살릴 구젱기에 미역 휘둥그니 따랜/눈물샘이 열릴 새나 어디 이수꽈(‘잠녀는 울엄쩌’- ‘해녀는 울었다’).
‘세 끼를 굶고 일해서 번 돈을 서방님 술값에 쓰는, 소로도 못 태어나서 한탄스러운’ 신세. 그들만의 속담, ‘여자로 나느니 쉐로 나주(여자로 태어나느니 소로 태어나는 것이 낫다)’를 떠올리게 한다.
지난달 25일, 제주시 한림읍 귀덕 2리에서 제주 해녀 9명의 첫 공식 은퇴식이 있었다. 그 중 김유생, 강두교 두 할머니는 올해 92, 91세로 77년 간의 물질을 마감했다. 한때 해녀 100명을 이끌고 바다에 들어갔던 제주도 최고등급 상군(上軍)인 그들은 ‘나 죽걸랑 바당(바다)에 뿌려도라. 죽어서도 물질허멍 살젠(물질하며 살고 싶어)’라고 말했다.
‘해녀는 등에 관을 지고, 칠성판을 지고 들어가는 일이라던데 구십이 넘도록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는 기자 질문에 ‘내려갈 때 본 전복은 따도, 올라올 때 본 전복은 잊는 거야. 전복이 대작대작 붙어 있어도 하나 더 따려고 되돌아갔다간 숨이 모자라서 죽어. 욕심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그게 다 자식들 연필 값이고, 공책 값이고, 책가방 값이니 다시 가 줍고 싶은 마음 태산이지만 잊어야 살 수 있지’라고.
과욕은 금물, 넘침을 경계하라는 계영배(戒盈杯)의 경고가 빛나는 말씀이다. 할머니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제주 방언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폭삭 속았수다! 소랑햄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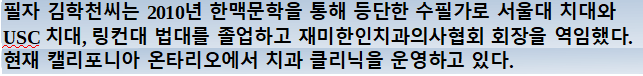
이전 칼럼 [김학천 타임스케치] 여섯번째 손가락과 세번째 엄지
이전 칼럼 [김학천 타임스케치] “아버지의 술에는 눈물이 절반”
관련 기사 맨몸으로 일군 바다 제주해녀, UN 세계중요농업유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