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덧 9월이다. 하지만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處暑)가 지난지 한참인데도 아직 폭염의 기승으로 가을이란 말이 무색하다. 그럼에도 ‘가을’이란 말만으로도 더위를 잊고 상념에 젖게 하는 그런 계절로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된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면 가을이다/…/사람이 보고 싶어지면 가을이다/편지를 부치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주머니에 그대로 있으면 가을이다/…/가을은 가을이란 말속에 있다’라고 읊은 시인의 말처럼 가을은 나와 함께 해줄 누군가가 그리운 계절이기도 하다. 비록 외로움을 달래줄 그 누군가와 만나고 헤어진 뒤 또 다시 허탈함과 공허함이 밀려온다해도 가을은 정겹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을은 책에 설레게 한다. 해서 얼마 전 ‘기도만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지 못할 때 좋은 책이 난관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이 더욱 마음에 와 닿는다.
독서광으로 잘 알려진 교황은 소설과 시를 즐겨 읽는다. 책상과 가방에는 성경 외에 늘 한 권의 책이 더 있는데 교황이 가장 사랑하는 문학 장르는 ‘비극’이라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교황은 ‘우리 모두 그들의 비극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우리 자신의 드라마를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등장인물의 운명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의 공허함과 결핍, 외로움에 대한 눈물이라는 의미다. 독서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공감 능력을 키우며 가장 외로운 사람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도 했다.
그러고 보니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아 온 장르는 비극이었다. 인간의 삶이란 어찌보면 고통과 불행이 이어지는 비극이자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 사투하는 전장이나 다름없고 종국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서일까?
그러니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함에도 가슴 아픈 결말에 이르는 비극의 주인공에게 몰입하게 되고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걸 게다. 이는 인간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공감 때문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감정의 카타르시스’라 했다. 그리고 인간은 이를 통해 끊임없는 성찰로 승화시키면서 자신을 한 단계 더 고결하게 만든다.
해서 김용택 시인은 ‘내 가슴은 늘 세상의 아픔으로 멍들어야 한다/ 멍이 꽃이 될 리 없다/ … /그리하여 나의 가슴은 세상의 아픔으로 늘 시퍼렇게 멍들어야 한다/ 그 푸르른 멍은, 살아 있음의, 살아감의, 존재 가치의 증거가 아니더냐?’고 했는가 보다.
이렇듯 다른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내것으로 같이 느끼고 실천하는 분들 중에 김수환 추기경을 빼놓을 수 없다. 마침 2009년 선종한 김 추기경을 성인(聖人)으로 추대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지난 6월 교황청이 김 추기경에 대한 시복 추진에 대해 ‘장애 없음’이라고 통보해 옴에 따라 서울교구청은 시복을 위한 절차로 관련 자료들을 엄격하게 심사해 교황청에 시복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다. 교황청이 이를 인정하게 되면 ‘가경자(Venerable)’ 호칭이 부여되고 추후 성인으로 추대할 수 있게 된다.
김 추기경은 생전에 ‘교회는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는 좌우명을 안고 살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슬퍼 우는 사람들을 수없이 찾아다녔지만 그들과 삶을 나누지는 못했음을 부끄럽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 만큼에 훨씬 못 미치는 우리는 에밀리 디킨슨이 남겨준 시 한 귀절을 따라가 보면 위안을 얻을 수 있을는지.
‘내가 만일 한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고/ 기진맥진 해서 떨어지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다시 둥지에 올려놓아 주었다면/ 나는 헛된 삶을 산 것이 아니리’ 라고 한 그 노래 말이다.
그러면 더딘 이 가을에 메마르고 고단한 우리의 마음을 그나마 지켜줄 ‘오아시스’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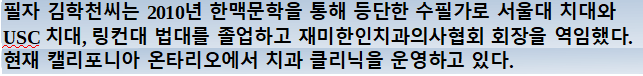
이전 칼럼 [김학천 타임스케치] 백제와 야마토, 그리고 교토 국제고
이전 칼럼 [김학천 타임스케치] 전기차 화재: 제2의 노벨작업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