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8년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소설 ‘설국(雪国)’이 일본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자 일본 전체가 들썩거렸다. 스톡홀름 수상식 연설에서 가와바타는 자신의 소설의 절반은 번역가가 쓴 거나 마찬가지’라며 감사를 표했다. 사실 그의 작품을 세계적 문학으로 끌어올린 주역인 변역가 사이덴스티커는 ‘뜻이 분명하고 조리있는 문장보다는 무슨 뜻인지 물어봐야 할 것이 많은 글에 끌린다’라고 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최초로 한국에 안기게 한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도 같은 말을 했다. 번역 작업을 하는 동안 한강 작가와 계속해서 의견을 주고 받으며 작가의 생각과 감정을 보다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단어 하나 선택에도 무던히 애를 썼다고 했다.
일례로 ‘정말이야?’ 하는 경우 확신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확신없는 머뭇거림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는 그런 어휘 발굴에서부터 그것을 영어로 표현해 낼 방법, 그 외에도 의역을 해야하는 등을 말한 거다.
그러다 보니 평론가들 말대로 영어판이 원문과 다르게 많은 변화가 있었고 ‘서양의 아이디어에 맞게 급진적으로 조정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데보라도 ‘서로 다른 두 언어사이에서 문법이나 단어가 다르고 심지어 구두점 하나에도 다른 무게를 지니는 이상 동일한 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창조적이지 않은 번역이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당연한 말이다. 언어는 나라마다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뿌리를 두고 생겨난 것인 만큼 다른 나라와의 언어 사이에 대체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작가의 탁월한 재능 못지않게 번역의 비중이 크다는 얘기다.

소설 ‘채식주의자’ 여주인공은 어느 날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잡아 먹는 동물에 대한 폭력 등으로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하게 된다. 그러자 아버지의 폭력이 가해지고 주위의 폭력적 시선 속에 살게 되다 정신병원에 갇히기도 한다.
이는 아버지로부터의 폭력과 남편에 의한 일방적 강간, 형부에게서 받는 관음의 대상 그리고 원치 않는 치료를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진행한 정신과 의사의 행위 등 모두가 섭생의 규범에 복종을 거부한 댓가로 당해야하는 가부장적 남성사회의 폭력에 대한 고발이었다.
작가의 또 다른 화제작 ‘5-18′ 광주와 희생자를 그린 ‘소년이 온다’와 제주 ‘4-3’사건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 역시 잔인한 인간과 국가의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다보니 아마도 이들과 마주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에 불편해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서만 정리되지 않는다. 역사가 사료를 기반으로하는 거시적 판단이라면 문학은 역사에 남지 못한 개인의 비극을 다루는 미시적 관점이란 점에서 후세 작가들의 몫이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로 거듭 태어났듯이 말이다.
그러고 보면 아직도 끝나지 않는 한국전쟁 6·25나 5-18 운동 그리고 4-3사건 등 또한 종결지어지려면 오랜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할는 지도 모른다.
어쨋거나 차겁고 무거워 읽기에 버겁다는 내용과 달리 그의 문장들은 유리처럼 맑고 투명하다는 찬사에 스웨덴 한림원 역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었다는 평을 내렸다. 시인의 이력 덕분이었던 것 같다.
한강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대표작들이 모두 매진되는 등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모습은 반가우면서도 씁쓸하다. 그것은 2016년 한 미국 문학평론가가 ‘한국인들은 책은 읽지 않으면서 노벨문학상 타기만을 바란다’고 꼬집은 칼럼이 기억나서다.
부디 이번 낭보로 일시적 신드롬이 아니라 독서의 저변을 넓히고 우리 문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K-문학의 세계화’가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마침 가을이다. 작가에게도 축하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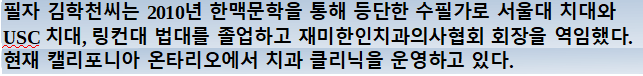
이전 칼럼 [김학천 타임스케치] 노벨상과 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