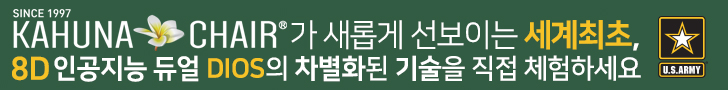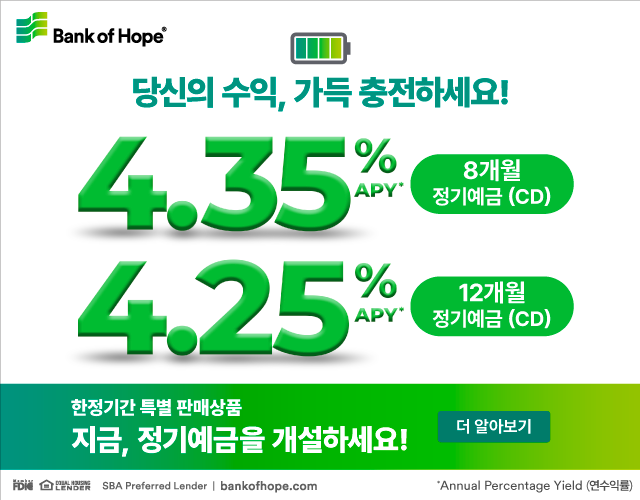우리 옛 선조들은 콩을 심을 때 세 알을 심어 하나는 새나 벌레에게 주고, 하나는 싹을 틔우고, 마지막 하나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한다. 또한 가을에 감, 대추, 사과 등 열매를 수확할 때도 나무 가지 끝에 열매 몇 개를 남겨놓아 주로 새들, 특히 까치가 겨울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는 생명 존중과 공존 그리고 나눔의 미덕 등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선조들의 삶의 태도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옛 선조들의 ‘콩 세 알’ 이나 ‘까치밥’ 정신처럼 공공의 몫을 자발적으로 담당하는 철학은 고대 서양 사회에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고대 로마-그리스 사회의 ‘리투르기아(liturgia)’ 제도를 들 수 있다.
리투르기아는 부유한 시민들이 공공사업이나 국가 행사를 자비로 부담하는 제도로 오늘날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개념과도 철학적으로 그 맥을 같이 한다. 다만 리투르기아의 기부와 책임이 제도화에 의한 것인 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그 정신이 도덕적 자율성과 명예감으로 변화한 것이긴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특권에 따르는 책임의식과 상류층의 자기헌신을 통해 공동체가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가진 자는 나눠야 한다. 그게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길이다’라는 철학에서 나오는 행위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기회를 얻고 그 기회를 발판 삼아 성공을 이루어내는 데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가정 형편 등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많은 저명한 학자, 과학자, 예술가 등이나 사업 초기 자금이 부족하거나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기회가 없었던 이들,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역경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이들 등이 기부금이나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고 성공적인 삶을 되찾아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얻는다면 이보다 더 큰 선순환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금전적인 기부 외에도, 성공한 사람들의 시간, 지식, 경험 등을 공유하는 멘토링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 또한 일종의 기부다.
암튼 어떤 형태로든 기부는 내가 가진 것을 잠시 내려놓아 세상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선택이며 나눔을 통한 사회적 연대의 실천임에 틀림없다.
지난 8일 MS 빌 게이츠가 최근 자신의 재산 99%를 게이츠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히고 세계 최고의 글로벌 건강 자선 단체 중 하나인 게이츠 재단을 20년 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대 기부 철학과 자산 활용 방식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른바 ‘소진형(spend-down)’ 방식이다.
게이츠 재단은 당초 부부 사후 50년에 걸쳐 활동을 하다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그 시한을 대폭 앞당기면서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기회는 지금이다. 미래에 남기는 것보다, 지금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것이 더 큰 유산’이라며 재단은 2045년 12월 31일 영구적으로 문을 닫고 그때까지 재단은 기금과 게이츠의 남은 개인 재산 거의 전부를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왜 다른 자선 기관들과 달리 영구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것일까? 그의 대답은 간명하다. ‘돈을 나중보다는 지금 쓰는 것이 우리를 더 야심 차게 만든다’며 ‘현재 개발중에 있는 생체 의학 도구 및 기타 생명을 구하는 혁신에 대한 전망을 고려할 때 지금이야말로 올인해야 할 때다. 돈을 지금 쓰는 것과 나중에 쓰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라 했다.
‘콩 세 알’ 중 ‘내 몫이 아닌 한 알’을 누군가를 위해 남기는 지혜를 실천하려는 최고의 레인메이커의 바램. 이는 ‘콩 하나를 심으면 셋이 되고, 셋을 심으면 아홉이 된다’는 또 다른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전 칼럼 [김학천 타임스케치] 포세 코미타투스 법과 내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