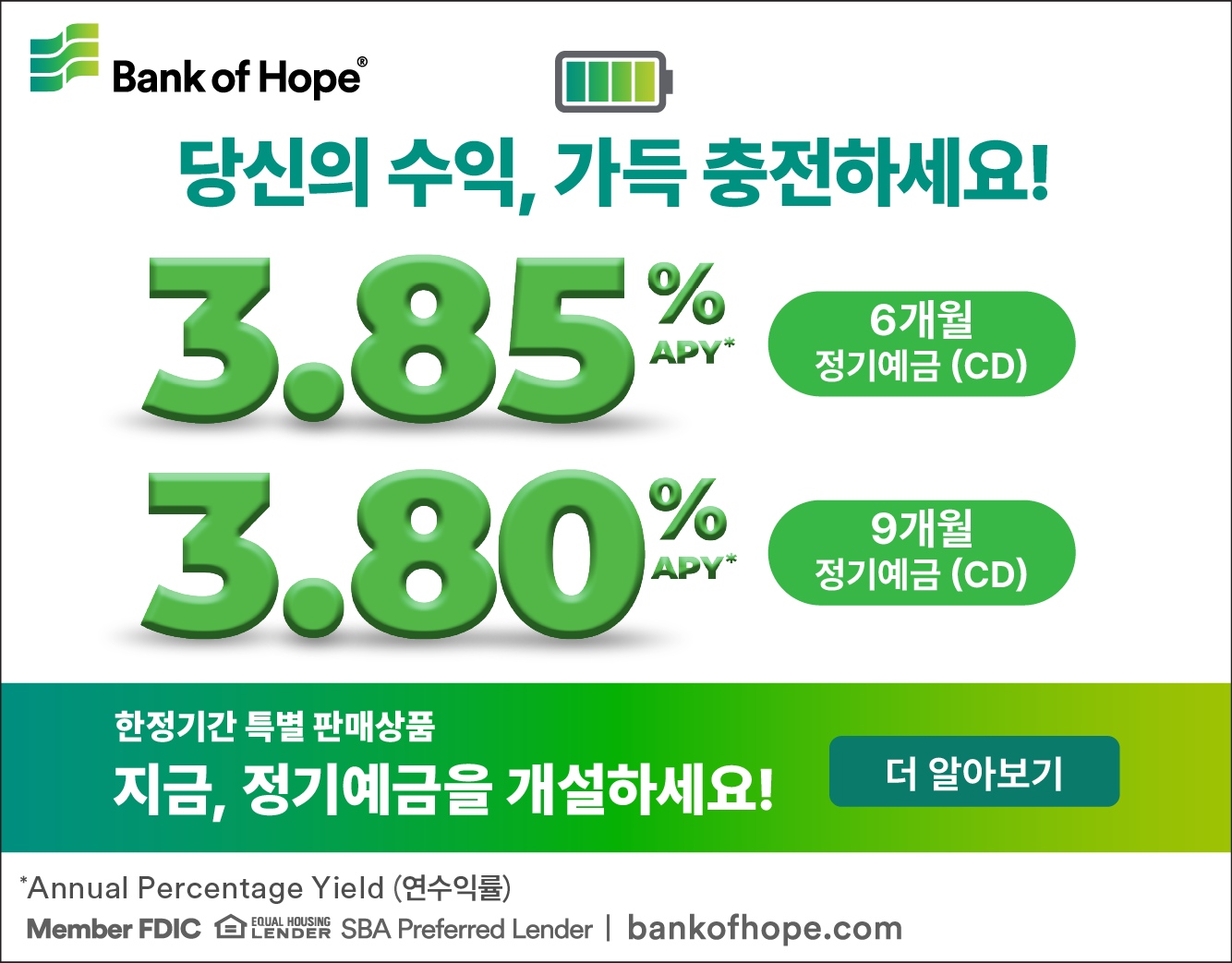자연에는 대칭이 많다. 코끼리와 나비의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이 생겼고 꽃잎과 불가사리는 중심점을 따라 같은 형태가 반복된다. 이런 현상은 단백질이나 RNA 구조에서도 나타난다. 사람의 심장이 가슴 왼쪽에 있고 수컷 농게의 한쪽 집게가 유난히 큰 것처럼 비대칭적인 것도 있지만 생물계에는 대칭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처럼 대칭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물학자들은 대칭이 자연도태에 따른 것임을 확신하지 못한다. 그런데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답이 제시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 보도했다.
이번 달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린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유전자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분자의 기본 연결망과 수천개의 단백질 복합체 및 RNA 구조를 분석했다. 그들은 대칭형을 만들어 내는 명령이 유전자 코드에 담고 작동하기에 쉽기 때문에 진화가 대칭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확인했다. “열심히 말고 효율적으로 하라”는 격언을 가장 잘 구현하는 기본적 수단이 바로 대칭인 셈이다.
논문저자인 아드 루이스 영국 옥스포드대 물리학자는 “사람들은 진화를 통해 이 멋진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데 크게 놀라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쉽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밝혀냈다”고 말했다.
공동저자 겸 영국 엑세터 대학교 강사 치코 카마고는 “우리가 자연의 새 법칙을 발견한 것 같다. 정말 멋진 일이다.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루이스 박사와 카마고 박사 및 동료 이언 존스턴은 대칭적 진화의 기원에 대한 탐구를 존스턴 박사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 시작했다. 바이러스가 단백질 외형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재현해보는 과정에서다. 당시 대칭적 구조가 발생하는 비율이 임의성 범위를 크게 넘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처음에 놀랐지만 알고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형태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알고리즘이 수행하기 쉬운 반면 실패할 가능성은 낮은 파악한 것이다. 노르웨이 베르겐대 교수인 존스턴 박사는 타일을 붙이도록 지시하는 일에 비유했다. 똑같은 크기의 사각형 타일을 이어붙이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복잡한 모자이크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보다 쉽다고 했다.
앞으로 10년 동안 연구자들은 단백질 군집과 RNA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 생물에 이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카마고 박사는 생물계에도 “단순한 형태가 더 자주 발생하고 복잡한 형태는 덜 나타난다”고 말했다.
RNA와 단백질을 알고리즘화된 유전 정보를 수행하는 최소 투입-산출 기계라고 규정하면 다윈의 “적자생존” 이론으로 대칭 경향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하고 대칭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명령을 코드화하는 것이 보다 쉽기 때문에 자연 도태에서 선택됨으로써 단순한 명령이 압도적으로 높게 발현된다는 것이다. 카마고 박사는 “무게중심이 단순성 쪽에 치우쳐 있는 주사위 놀이”로 비유했다.
이들의 논문은 미세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연구자들은 같은 논리를 보다 크고 복잡한 유기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존스턴 박사는 “해바라기 꽃잎 100개마다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같은 프로그램을 반복 적용하는 것이 엄청나게 말이 된다”라고 했다.
미세구조에서 나타나는 대칭성과 식물이나 동물에서 나타나는 대칭성 사이에 통계학적 비율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그러나 헝가리 데브레센 대학교에서 대칭성을 연구해온 생물학자 홀로 가보르는 이 논문의 결과가 놀라운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속 모든 진화과정에서 보편적 특성이 내장돼 있고 발현된다는 것을 함께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문 저자가 아니다.
스페인 국립중앙바이오기술센터 복합시스템 연구원 루이스 세오아네도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논문저자가 아닌 세오나네는 “단순성과 복잡성 사이에 경쟁이 있으며 우리는 그 경쟁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우주는 갈수록 임의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단순하고 대칭적인 구조 단위들로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