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입국 심사 기준에 ‘반미주의(anti-Americanism)’를 새롭게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거세다.
이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인 SNS검열에 이어 반미적 발언이나 활동을 이유로 비자 취소 및 입국 거부까지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모호한 기준 탓에 ‘현대판 메카시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 발표에서 앞으로 이민 신청자, 유학생, 취업 비자 신청자 등이 ‘반미주의’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심사 항목에는 테러 조직 연루 여부, 반유대 활동과 함께 반미적 발언이나 행위도 포함된다.
USCIS 매튜 트래게서 대변인은 “미국의 혜택은 미국을 멸시하고 반미 이념을 조장하는 자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절차로 반미주의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반미주의’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번 정책 업데이트 어디에도 구체적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다만 1952년 이민 및 국적법(INA)에 등장하는 ‘반미’ 관련 사례들이 언급됐다. 여기에는 공산당 당원, 세계 공산주의 옹호자, 무력으로 정부 전복을 기도한 인물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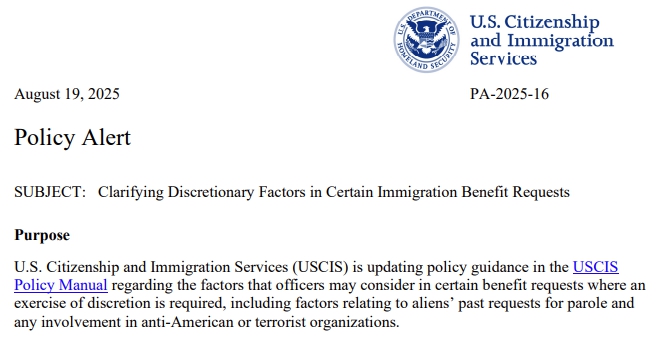 CNN은 이 같은 발표 이후 온라인 포럼과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이란 공습 반대, 가자 지구 휴전 지지, 트럼프 비판도 반미로 간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다고 전했다.
CNN은 이 같은 발표 이후 온라인 포럼과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이란 공습 반대, 가자 지구 휴전 지지, 트럼프 비판도 반미로 간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미국 이민협의회 에런 라이클린-멜닉 수석 연구원은 “반미주의라는 용어는 이민법에서 전례가 없고, 정의는 오직 행정부의 해석에 달려 있다”며 “이는 1950년대 공산주의 색출 광풍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민 변호사 스티븐 브라운 역시 “소위 미국적 가치는 국적법에 존재하지 않는 주관적 기준”이라며 자의적 적용 위험성을 경고했다. 브리검 영 대학교 사회학과 제인 릴리 로페즈 부교수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반미 여부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민자들이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미 올해에만 학생 비자 6천 건 이상이 취소됐다. 이번 조치가 실제 이민 및 유학 심사에서 대규모 비자 거부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