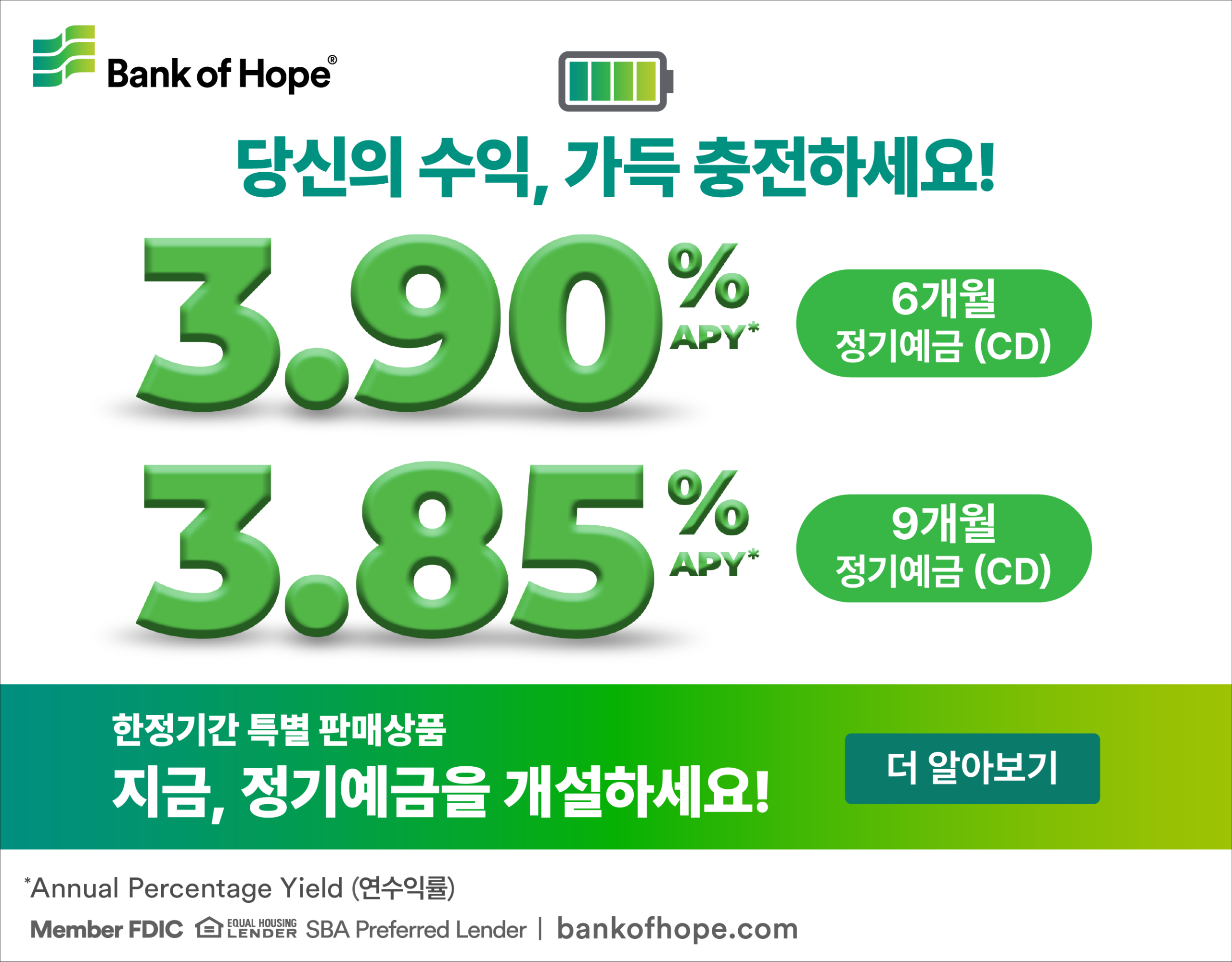‘이고 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설워라커든 짐을 조차 지실까.’ 조선의 문신 송강 정철(鄭澈)의 시조다.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설워라커든 짐을 조차 지실까.’ 조선의 문신 송강 정철(鄭澈)의 시조다.
늙고 힘없는 노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 그리고 슬픔이 담겨 있다.
허나 옛날 노인은 어른으로써 지혜로운 존재로 공경을 받았다. 일찍이 공자는 ‘열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고 서른에 자립하고 마흔에 불혹, 쉰에는 지천명하고 예순에는 이순하며, 일흔이 되어 마음이 가는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일흔을 당나라 시인 두보는 ‘인생칠십고래희’라 하여 ‘삶에 있어 칠십도 드문 일이다’라고 했다. 그만큼 당시는 수명이 길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허나 오늘날은 어떤가? 과거보다는 노인의 수명도 길어지고 사회 역할 비중도 많이 변하는 등 100세 시대라는 말이 놀라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그럼에도 현대사회라고 해서 늙어감의 비애를 피할 수는 없다고 해도 그 삶의 태도나 질에 있어서는 사뭇 다르다.
노인정신의학 전문의 아그로닌 박사는 ‘몸과 뇌는 나이가 들면 기능이 약해지고 퇴보하지만 전체적인 기능은 전과 다름없이 안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나이 든다는 것은 늙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년에 생기는 장점으로 ‘지혜와 회복 탄력성 그리고 창의성’을 꼽았다. 지혜는 새로운 형태의 능력으로 키워지고, 회복 탄력성은 젊을 때보다 충동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고 스트레스에 노련하게 대처하면서 증진된다고 했다.
특히 이전에 없던 통찰력이 생겨 창의성이 더욱 발달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엉켜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활동이나 관계를 형성하는데 더욱 능숙해 진다는 것이다. 이는 ‘노년의 지혜’란 호르몬의 작용 때문이라는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다.
‘노년의 지혜’를 상기시키는 고사성어가 있다. 중국 제(齊)나라 환공(桓公)은 봄에 원정을 떠나 고죽국(孤竹國)을 치고 겨울에 돌아오는 도중에서 눈이 내려 길을 잃었다. 그러자 재상이었던 관중(管仲)이 아뢰었다. ‘늙은 말의 지혜를 쓰십시오.’ 그의 말대로 풀어놓은 늙은 말은 고향길을 잘 알고 있어 그 뒤를 따라 제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다데서 나온 ‘노마지로(老馬知路)’혹은 ‘노마지지(老馬之智)’라는 말이다.
이 이야기가 떠 오른 것은 며칠 전 한국에서 느닷없는 발언으로 ‘노인 비하’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야당 혁신위원장이 ‘미래가 짧은 분들이 왜 청년들과 1 대 1 표결을 해야 하느냐’며 평균수명까지 남은 생애에 비례해 투표권에 차등을 두자는 취지의 말이었다. ‘중학생 아들이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며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말이었다.
그러자 또 다른 의원이 ‘그 말이 맞다’고 가세하며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라고 SNS에 올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거다.
한마디로 고령의 유권자들은 후손들을 위한 긴 안목 없이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젊은이들의 미래를 노인들이 결정한다는 논제는 차제하고라도 재산, 신분, 성별, 종교, 피부색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1표’라는 원칙을 위해 많은 희생을 치러온 보통, 평등선거의 역사가 무색해 보인다.
한때 레이건 전 대통령은 로마의 한 정치가이자 철학가의 말을 인용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연장자들이 젊은이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아 오지 않았더라면 역사에서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