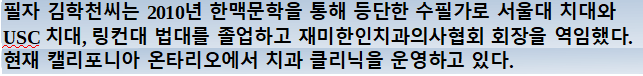12세기 고려를 방문했던 송나라 사람 서긍(徐兢)이 지은 ‘고려도경’에 보면 ‘그 곳 풍속은 모두 깨끗해 시냇물에서 자주 목욕을 하는데 남녀 구분 없이 벌거벗고 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조선 유교에서 강조하는 ‘남녀칠세부동석’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다.
12세기 고려를 방문했던 송나라 사람 서긍(徐兢)이 지은 ‘고려도경’에 보면 ‘그 곳 풍속은 모두 깨끗해 시냇물에서 자주 목욕을 하는데 남녀 구분 없이 벌거벗고 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조선 유교에서 강조하는 ‘남녀칠세부동석’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다.
이 외에 고려가요 내용을 봐도 고려는 남녀 관계에 상당히 개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래들은 후에 조선에 들어와 ‘남녀상열지사’라 하여 폄하되고 금기시됐다. 더 나아가 ‘내외법(內外法)’에 따라 심지어 남녀가 서로 말을 주고 받는 것조차 제약을 받았다. 유교적 사유방식에 따라 남녀가 유별되는 사회 질서였기 때문이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런 남녀유별의 관념은 가옥 구조에도 영향을 끼쳤다. 사대부들은 주거 공간에서 조차 내외를 구분지었다. 남성은 사랑채를, 여성은 안채를 삶의 거처로 삼아 부부라도 일상의 대부분을 별도의 공간에서 보내고 심지어 동침조차 까다로웠던 거다. 태종실록에 나오는 ‘부부 별침(夫婦別寢)’이다.
오늘날 부부가 각 방을 쓰면서 따로 생활을 하고, 필요할 때만 만나 용무를 본다면 이를 두고 대개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드물게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인가 보다 할 게다.
하지만 인류사적으로 볼 때 ‘한 침대 쓰는 부부’는 최근의 일이란 분석도 있다. 부부 침대의 대명사인 ‘더블베드’는 인구 밀집의 계기가 된 산업혁명 이후 보편화됐다고 한다. 30년 넘게 부부관계를 연구한 사회학자 카우프만(Jean-Claude Kaufmann)은 ‘각방예찬’ 저서를 통해 ‘과연 함께 자야만 이상적인 부부인지, 침대를 함께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들을 풀어냈다. 그리고는 ‘더 잘 사랑하려면 떨어져서 자야 한다. 같이 자는 한 침대는 사랑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새로 시작한 연인들이나 부부들에게 침대는 사랑과 관계라는 로맨틱한 공간일 게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가고 서로에게 익숙해지면 하나 둘 불편한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된다. 차마 드러내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속으로나마 각방을 꿈꾸고 있는 건 아닐는지.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침실이라는 특수공간 때문이다.
침대는 자기만의 하나의 작은 세계다. 그곳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사색이나 독서 혹은 엔터테인의 장소이기도 하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나만의 완전한 세계인 셈이다.
헌데 결혼을 하는 순간 그 공간에 나 아닌 다른 이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함께하지만 혼자일 수는 없을까’하는 생각이 한번 쯤은 들을 법도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지난 5일 WSJ이 최근 미국에서 숙면을 위해 따로 침실을 쓰는 ‘수면 이혼(sleep divorce)’이 확산된다고 보도했다. 미국수면의학회(AASM) 조사에 따르면 부부 1/3 이상이 따로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유로는 ‘코골이, 이갈이, 잠꼬대’ 같은 생리적 문제나 서로 다른 ‘생활 리듬’ 혹은 ‘선호하는 잠자리 온도 차이 등이었다. 물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프라이버시도.
헌데 ‘이혼’이란 표현이 그다지 썩 달갑지는 않은지 ‘수면동맹’이라고도 한다는 데 잠을 두고 협상을 연상케 하는 전의(戰意)마저 느끼게 한다. 허긴 잠이 삶의 1/3을 차지하는 만큼 그럴 수 밖에.
게다가 전문가들도 수면이 부족하면 짜증이 늘고 자주 다투게 되는 것은 물론 면역력에 영향을 주고, 우울증을 비롯해 뇌졸중, 심혈관 질환,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진다며 따로 자는 것이 서로를 덜 원망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추천한다니 말이다.
그러고 보니 ‘잠이 보약’이란 말이 더욱 실감나고 그러기 위해 별침(別寢)이라는 처방전을 따라야 한다는 지경인데 그럼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옛말은 틀리다고 해야 하는 걸까? ‘Do not disturb, please!’ 팻말 내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