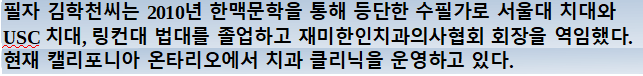2010년 9월 테네시주 오비언 카운티(Obion County)에 사는 진 크래닉은 집에 불이 나자 911에 전화를 했지만 소방차는 오지 않았다. 당시 오비언 카운티에는 자체 소방서가 없고 소도시들이 각자 소방세를 걷어 운영하는 ‘자치 소방서’가 있었지만 시(市) 밖의 주민들이 이 도움을 받으려면 인근 시(市)에 ‘소방 정기요금’을 내야 했다.
헌데 크래닉은 연간 75달러의 정기요금을 내지 않았기에 소방 출동을 거부 당했던 거였다. 이를 뒤늦게 깨달은 크래닉은 필요하다면 뭐든 지불하겠다며 도움을 호소했지만 소방서는 끝내 대응해 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크래닉 집의 불이 주위로 번지자 소방대가 출동했지만 요금을 완납한 옆집 불만 끄고 돌아갔고 그 결과 크래닉 집은 전소되고 말았다.
후에 비난 여론이 일자 풀턴 시 소방당국은 시 경계 밖 지역에도 출동하지만 정기적으로 요금을 지불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이고 불이 난 현장에선 소방 요금을 납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납부가 가능해지면 불난 집만 소방 요금을 납부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말하자면 ‘돈을 안 내도 불을 꺼주면 누가 돈을 내느냐’는 얘기다.
미연방재난관리청(FEMA)에 따르면 정부 등록 소방본부는 90% 정도이고 그 나머지는 사설 소방회사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소방서가 없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정기요금을 받고 불이 나면 출동해준다.
이러한 사설 소방대는 고대 로마에서 시작했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와 삼두 정치를 했던 크라수스는 노예 500-600명으로 소방대를 조직했다. 그리고는 불이 난 곳에 출동해 고액의 돈을 요구하고 내면 불을 꺼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방치하는 식으로 부를 쌓아 당대 로마 최고의 부자가 됐다.
1666년 영국 런던 대화재는 시내 85%를 잿더미로 만든 대참사였다.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 보험회사들이 중심이 된 소방활동이 조직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집 외벽에 ‘파이어 마크(fire mark)’를 표시한 보험 가입자 집들만 불을 꺼주는 식이었다.
지금도 사설 소방회사들의 가장 큰 고객이 대형 보험회사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설 소방서비스가 예산이 부족한 지역들을 겨냥해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재연되고 있다고 한다.

때마침 다발적인 LA 대형 산불로 그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부유한 주민들이 하루 1만 달러 이상 드는 사설 소방대를 부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 중 막대한 피해를 입은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도 사설 소방대가 지킨 쇼핑몰은 멀쩡했다고 하니 화재 진압도, 그 피해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갈라지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사설 소방부대는 재난 시 부유층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으로 계급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에 대해 사설 소방대는 이런 서비스가 서로에게 윈-윈이라고 반박한다. 주택 소유주의 집을 구하면 보험회사는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그런가하면 일각에선 사설업체 소방관들이 특정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물을 끌어다 쓰면서 전체적인 불길을 잡으려는 정규 공공 소방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태평양에서 로키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치누크라 하고 반대로 동쪽에서 서부로 부는 바람은 샌타아나(Santa Ana)라고 부른다. 지금 LA를 잿더미로 만들고 있는 바로 이 샌타아나 바람은 ‘악마의 바람(Diablo Wind)’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그 파괴력에 따른 피해가 엄청나서다.
이 ‘악마의 바람’이 ‘천사의 도시’를 연일 잿더미로 만들고 있다. 눈물겨운 소방관들의 사투를 보면서 그저 바람이 잦아들기만 기원할 뿐, 안타깝다. 정녕 ‘산불은 인간의 환경파괴에 대한 자연의 저항권 행사’란 주장이 맞는 말일까 생각해 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