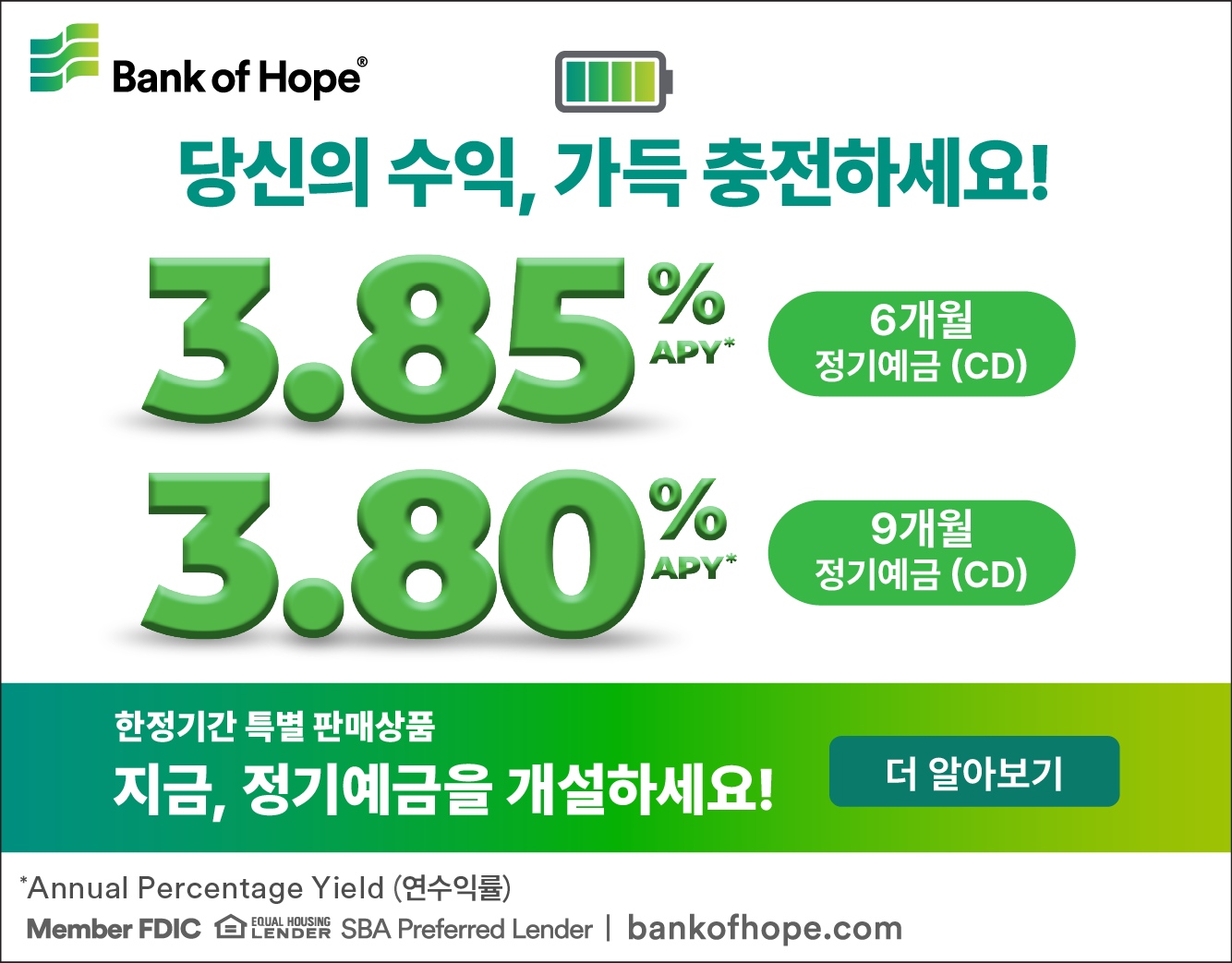고(故) 이어령 교수는 ‘쓰레기’와 ‘시레기’라는 단어의 차이를 통해 한국인의 철학을 설명한 적이 있다. ‘쓰레기’는 아직 쓸 수 있는 것들을 조급하게 내버리는 것에 반해 ‘시레기’는 무우를 버리지 않고 말려 겨울을 견디면서 천천히 변화시켜 더 깊은 맛과 영양을 얻게 하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버려질 것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소중하게 활용하는 의식이 시레기로 변화시키는 창조적 재생산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사물을 바라보는 이러한 차이는 고고학에서도 드러난다. 놀랍게도 고고학자들은 성벽이나 왕궁보다도 옛날 사람들의 쓰레기 더미(Midden)에 더 깊이 몰두한다고 한다. 이른바 ‘쓰레기 고고학(考古學)’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고대인의 식생활, 화장 습관, 사회계층, 거래 흔적, 병, 전쟁의 상처 등을 통해 그들의 삶을 되짚어 볼 수 있어 ‘쓰레기야말로 진짜 인간의 역사’여서다.
로마의 몬테 테스타치오는 폐기된 항아리들로 이루어진 인공 언덕이지만 그 안에는 제국의 무역과 소비의 흔적이 담겨 있으며, 1980년대 비디오게임회사 아타리(Atari)가 내다버린 전자폐기물들이 매립된 뉴멕시코 사막의 쓰레기장에서는 디지털 소비문화를 드러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버리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건강을 말하면서도 정크푸드를 더 많이 버리고, 환경을 생각한다면서도 일회용품 사용은 줄지 않고 있다.
애리조나 대학의 투산 쓰레기 프로젝트가 이를 증명한다. 사람들이 ‘건강식을 먹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그들이 버린 쓰레기에서는 패스트푸드 포장지가 가득했다. 버린 쓰레기가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낸 것, 쓰레기는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의 진실한 거울이었던 셈이다.
이렇듯 우리가 매일 끊임없이 모으고, 소비하고, 버리며 쓰레기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물건이 낡아서라기 보단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나 과거와 단절하고픈 의식 때문일 게다. 이는 비단 음식이나 포장지 같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사람, 관계, 기억, 심지어 죄책감까지도 버려진다.
하지만 버린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 흔적들은 고스란히 지구의 내면에 쌓인다. 그리고 그것들은 낡아 못쓰는 것들뿐만 아니고 애써 외면하려는 우리의 과거, 욕망, 부끄러움, 사랑 등으로 얼룩진 모습들일게다.
그러다보니 때론 그 버려진 것들 속에서 값진 발견들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뉴욕의 위생부에서 일하던 한 쓰레기 수거원, 넬슨 몰리나는 30년 동안 수거 중 발견한 의자, 그림, 장난감, 사진, 액자 등을 모아 차고에 ‘쓰레기의 보물 박물관’을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독일의 포장재 박물관, 일본의 재생 박물관도 쓰레기 속에서도 가치를 발견하는 혜안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것들은 넘쳐나는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문명이라는 이름아래 무분별한 소비와 빠른 유행은 끊임없이 새로운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환경 오염과 자원 고갈의 심각한 원인이 된다. 그리고 버려진 쓰레기들은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고, 그곳의 어린이들은 납과 카드뮴이 가득한 전자부품을 맨손으로 분해한다.
문제의 해답은 우리의 의식 변화에 있지 않을까? ‘시레기의 철학’ 말이다. 무조건 버리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창조적으로 재생산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지혜, ‘쓰레기’를 만드는 의식에서 벗어나 ‘시레기’를 만드는 의식이 생각나는 이유다.
마침 지난 4일 한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쓰레기 고고학’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지금의 우리 삶의 모습 역시 먼 미래가 아니더라도 당장 발굴조사 대상이 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