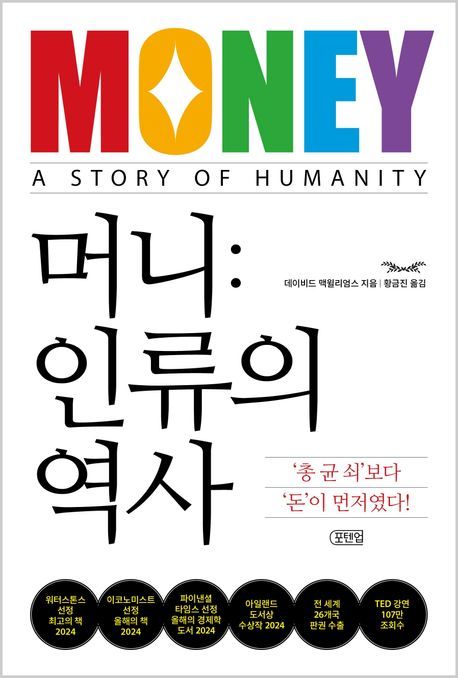 화폐는 혁신의 강력한 수단이다.
화폐는 혁신의 강력한 수단이다.
아즈텍문명에 금융시스템이 전무했다는 점만 봐도 왜 유럽이 기술적으로 앞설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해준다.
고결한 이상과 번드르르한 수사 뒤에 숨겨진 진실은 대부분 혁명이 결국 ‘돈 문제’라는 것이다. 혁명가들은 대개 ‘돈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다.
그 관점에서 살펴보면 명목화폐 시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활발했던 세계 경제의 확장기와 맞물려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사람들에게 돈이 생기면 경제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기적이 벌어진다.
책 ‘머니: 인류의 역사'(포텐업)의 저자인 아일랜드 경제학자 데이비드 맥윌리엄스가 보기에는 인류 역사에서 ‘총 균 쇠’보다 ‘돈’이 먼저였다.
저자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돈을 통해 5000년 역사를 관찰한다.
‘총 균 쇠’라는 막강한 힘으로 유럽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전 세계를 지배한 것은 알고 있지만 식민지 사업을 가능하게 만든 건 ‘금융업’이었음은 잘 알지 못한다.
저자는 인류의 대부분이 노예이던 시절부터 물물교환, 금속화폐의 등장, 중세 이후 지폐의 등장, 상업과 금융시스템의 발달을 거쳐 오늘날 디지털 경제와 암호화폐까지 돈의 진화에 대해 논한다.
저자는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연대기적 사건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인류 최초 기록으로 이름이 남아 있는 쿠심부터 네로 황제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단테, 피보나치, 구텐베르크와 표트르 대제, 오늘날 명목화폐 체제 토대를 만든 알렉산더 해밀턴, 사업가와 예술가가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준 제임스 조이스, 미국 계급투쟁과 문화전쟁을 상징하는 ‘오즈의 마법사까지 들려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