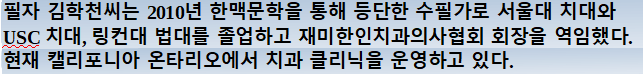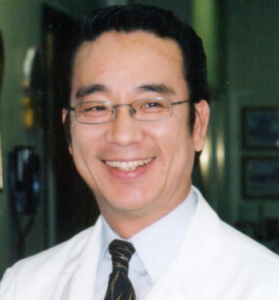 식물은 지구 생명체의 99.7%를 차지한다. 이는 인간과 동물이 0.3%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식물은 지구 생명체의 99.7%를 차지한다. 이는 인간과 동물이 0.3%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그러니 식물이 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인간이 그 모두를 지배하면서 인간에게만 지능이 있는 듯 살아왔다.
하지만 기원 전부터 현인들이나 학자들은 식물에게도 지능이 있다고 믿어왔다. 그 중에 찰스 다윈은 ‘식물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진보한 생물체’라며 사람의 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구조가 뿌리에 있다고 주장했다.
해서 나무는 뿌리를 뻗을 때 기온이나 습도, 소리의 진동,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 같은 여러 요소들을 섬세하게 감지해 이에 따라 적응한다. 더 나아가 같은 종류끼리 서로 이웃해 있는 경우 뿌리 경쟁을 자제하는 가하면 옆 나뭇가지와 자신이 얼마나 가까운지도 감지하고 서로 맞닿지 않도록 간격을 두고 자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초록이 싱그러운 여름, 여기저기 우거진 나무들은 물론 삼림이 울창한 숲을 보면 신기하게도 마치 사람이 가지치기라도 한 것처럼 나무들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수관(樹冠) 기피(Crown shyness)’ 라는 현상이다.
수관(樹冠)이라 함은 나무 꼭대기에서 뻗은 가지와 잎들이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서로
경계를 지키며 갓 모양으로 이룬 모습이 마치 왕관 모양을 닮았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아직 그 기전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해충과 병해를 막기 위해서라든지, 바람에 의한 가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 혹은 가지의 끝부분이 광합성에 필요한 햇빛의 양에 매우 민감해 다른 나무가 접근할 경우 성장을 멈추면서 빚어지는 현상 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나무들 사이에 생기는 간격 내지 틈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햇빛이 숲에 들어오게 되어 광합성 작용과 해충과 질병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된다는 거다.
이는 더 나아가 숲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만 살려고 고집하지 않고 각자의 공간을 알맞게 지켜줌으로써 숲 밑에 있는 작은 나무나 풀꽃들까지도 햇볕을 받을 수 있게 배려하게 되는 거다.
다시 말해 이러한 식물의 거리 두기는 생존을 위한 본능인 동시에 공생인 셈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지 어느덧 삼 년째 들어서는데도 각종 변이의 추세를 따라잡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계속되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예방 수칙에 사람들은 지쳐가고 다소 해이해 지기까지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싫든 좋든 인류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 기존의 생활 방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때에 나무들의 ‘수관 기피’ 현상은 특히 해충과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나무들이 스스로 거리를 둔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리를 지어 살아야 하는 환경에서 ‘수관 기피’를 통해 서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나무들의 지혜가 돋보여서다.
어찌 보면 다닥다닥 붙은 빌딩 숲에서 사는 우리나 빽빽한 숲에서 사는 나무들이 서로 다르지 않을 진대, 왕관을 닮아 붙여진 수관이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나무들이 하는 거리 두기와 마찬가지로 왕관 모습에서 따온 이름의 코로나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거리 두기가 마냥 우연만은 아닌 듯 싶다.
장구한 세월 조화롭게 숲을 이뤄 온 나무들의 지혜를 인간이 이제서야 늦게나마 배우게 될 줄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