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게해(Aegean Sea)와 지중해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게 세상 유일의 큰 바다였다. 또한 이곳을 둘러싼 그리스, 스파르타,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카르타고와 로마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등 무수한 세력들 간의 패권 전쟁으로 점철된 곳이다.
에게해(Aegean Sea)와 지중해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게 세상 유일의 큰 바다였다. 또한 이곳을 둘러싼 그리스, 스파르타,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카르타고와 로마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등 무수한 세력들 간의 패권 전쟁으로 점철된 곳이다.
그 중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것은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에 대한 음유시인 호머가 지은 서사시 ‘일리아스(Illias)’다. 이는 ‘일리온에 관한 시(詩)’라는 뜻으로 일리온은 바로 트로이(Troy)를 말한다. 비록 트로이가 그리스와의 10년 전쟁 끝에 패망하고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튀르키에다.
이 뿐만 아니라 수 많은 패권타툼의 결과, 점령 세력에 따라 도시의 주인이 바뀌면서 그 이름도 비잔티움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 코스탄티니예 등을 거쳐 오늘의 세계적 명소로 자리잡은 곳 또한 튀르키에의 이스탄불(Istanbul)이다. 이스탄불이 이렇듯 주변 모든 세력들이 차지하기 위해 질시와 탐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당시 세계의 부 2/3가 몰린 번영도시였기 때문이었다.
이스탄불은 그리스어로 ‘도시’란 뜻이다. 이는 중세 유럽인들에게 ‘도시’란 바로 이스탄불을 가리키는 의미이기도 했다. 튀르키에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이면서 ‘이스탄불 작가’로 더 잘 알려진 오르한 파무크 (Orhan Pamuk)는 대표작 ‘검은 책’에서 이렇게 썼다. ‘도시 이름이 바뀔 때마다 한 문명이 몰락하면서 역사의 지형도가 바뀌었지만 이스탄불의 정체성은 두 문명의 조화와 융합에 있다’고.
비록 오스만제국이 로마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도시를 점령한 후 이스탄불로 부르면서 ‘이슬람의 수호자’로 더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이스탄불은 동양과 서양,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을 잇는 다리인 동시에 이슬람과 기독교 두 종교의 통로역을 톡톡히 해왔다.
이 때문에 이스탄불은 각종 신화, 종교, 예술, 문화 등 그 모두가 혼합되어 성 소피아 성당, 블루 모스크, 톱카프 궁전, 고고학박물관 등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모든 문명이 그 자취를 남기고 세계로 전파되어 나간 곳이다. 이스탄불에는 모든 것이 있다는 얘기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세개의 지중해가 3개의 해협으로 연결되는 튀르키에는 지정학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러시아 함대도 이곳 해협을 지나려면 튀르키예의 감시를 받아야 하고 중국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무엇보다 일대일로의 육지 노선 종착역의 하나가 이스탄불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상대인 이유다.
그런 튀르키에가 대지진으로 금세기 최대의 재앙을 맞고 있다. 이에 오르한 파무크 (Pamuk)가 정부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다.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국민이 그렇게 화가 난 걸 본 적이 없다’며 정부의 부실한 조치로 구호물품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거다.
그의 비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튀르키예의 전신인 오스만 제국이 1915년 알메니아인 100만여명과 쿠르드족 13만여명을 학살했다고 발언한 것이나 2016년 군부 쿠데타 미수사건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의 대규모 숙청을 두고 ‘공포정치 체제로 향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7,000명의 사상자를 낸 1999년 대지진으로 나온 정권 심판론을 기회로 권력을 잡게 되면서 지진세를 도입했다. 지난 20여 년간 징수한 지진세는 약 60 여억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의 관리부실로 내진설계가 잘 안된 불법 건축물들은 팬케이크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렇다 보니 ‘대체 돈을 어디에 쓴 거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거다.
지진에 대비하지 않고 20년간 철권통치를 해 온 에르도안은 결국 지진으로 위기를 맞게 된 셈이 됐다. 군주민수(君舟民水)라했던가. 강물은 배를 뒤집는다는데 ’21세기 술탄’ 과연 그가 예외가 될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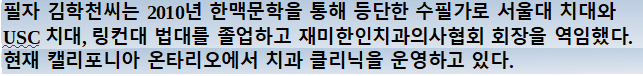 관련기사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