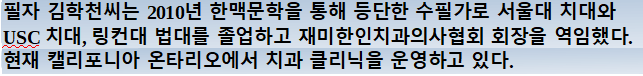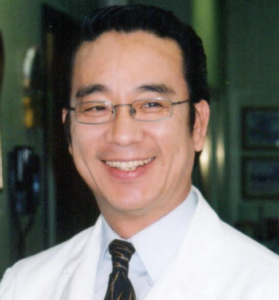 메사추세츠 남쪽에 부메랑 모양의 작은 섬 하나가 있다. 지금은 퇴락한 촌락이지만 한 때는 고래잡이 본고장이었던 낸터킷(Nantucket)이다. 19세기 그 곳 남자들은 일반 어부들과 달리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며 한 해에도 수천 마리의 고래를 잡았다. 그리고 기름을 짜냈다. 이 기름은 대륙으로 비싼 값에 팔려나갔고 낸터킷은 갈수록 번성해 포경산업의 중심지가 됐다.
메사추세츠 남쪽에 부메랑 모양의 작은 섬 하나가 있다. 지금은 퇴락한 촌락이지만 한 때는 고래잡이 본고장이었던 낸터킷(Nantucket)이다. 19세기 그 곳 남자들은 일반 어부들과 달리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며 한 해에도 수천 마리의 고래를 잡았다. 그리고 기름을 짜냈다. 이 기름은 대륙으로 비싼 값에 팔려나갔고 낸터킷은 갈수록 번성해 포경산업의 중심지가 됐다.
당시 포경선이 700여 척, 종사자가 7만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석유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불을 밝히는 등불이나 기계의 윤활유에 고래기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포경산업이 발전했던 것이다. 허나 무분별한 남획으로 고래의 수가 줄자 고래사냥은 대서양에서 태평양을 건너 일본과 조선으로까지 뻗쳤다.
이렇게 고래잡이에서 시작하여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거치며 조선의 개항도 이루어지게 된 거였다. 1819년 여름, 이 섬에서 출항해 고래잡이에 나섰던 포경선(捕鯨船) ‘에식스 (Essex)’호는 남태평양에서 24m가 넘는 거대한 향고래에 받혀 침몰했다.
선원 20여명 중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8명. 20 여 년이 흐른 후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죽음으로 인한 생활고로 여러 직업을 전전하던 끝에 포경선에 몸을 싣고 3년 여 동안 고래잡이 선원으로 일하며 바다 곳곳을 누비던 한 인물이 에식스호의 참사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서 영감을 얻은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명작 소설 하나를 남겼다. 허먼 멜빌 (Herman Melville)이 쓴 ‘모비 딕 (Moby-Dick)’이다. 허나 단지 거대한 고래에 다리를 잃고 고래뼈로 된 의족을 달고 복수심에 불타올라 모비딕을 쫓다가 목숨마저 잃게 되는 한 인간의 처절한 사투를 그린 스토리만이 아닌 성서와 고전 문학과 연결되어 아직도 난해다는 평을 듣는 이 작품은 20세기 중반만 해도 영국 도서관에서 ‘문학’이 아니라 ‘고래학’으로 분류됐을 정도로 고래에 대한 세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모비딕의 배경으로 낸터킷과 같이 태평양에서 고래잡이의 중심지로 나오는 곳이 마우이 섬과 라하이나(Lahaina)다.
당시 라하이나에는 고래잡이 포경선이 400여척이나 드나들었을 정도였다니 오늘날 마우이에서 매년 2월 셋째 주 일요일을 ‘세계 고래의 날’로 지정한 것이 우연만은 아니게 보인다. 생태계 보호는 물론 환경 위기에 처한 지구, 인류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고래의 오늘날 수가 예전의 1/4 수준으로 줄어든데서 시작된 것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나무 한 그루가 연간 최대 50파운드 정도의 탄소를 흡수하는 반면 대왕고래는 평균 30여톤의 탄소를 흡수한다고 한다. 또한 고래의 배설물을 먹고 자라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배출하는 산소가 나무 1조7천억 그루와 아마존 4개를 모아 놓은 양이라고 한다. 고래육성이 지구온난화를 완하시키는 해결사일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지난 8일 마우이섬에서 발생한 산불로 옛 하와이 왕국의 수도였던 서북쪽 해안도시 라하이나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인구 12,000명의 도시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다.
마치 200여년 전 번성했던 낸터킷이 고래 기름과 목재에서 발화한 대화재로 시가지가 전소되고 수백 가구가 집을 잃고 수많은 주민들이 섬을 떠나 도시가 쇠퇴하였듯이 말이다. 남태평양의 고래잡이 메카였던 이곳, 지상의 낙원이라고 불린 이곳에 이런 재앙이 있을 줄이야. 고래 기름과 석유로 인한 자연 재해만이 원인일까? 원주민 언어로 ‘잔인한 태양’을 뜻하는 라하이나. 무엇이 그토록 잔인했기에 붙여진 이름일까 안타깝기만 하다. 부디 모든 것이 하루 속히 회복되어 하와이 눈물이 닦아지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