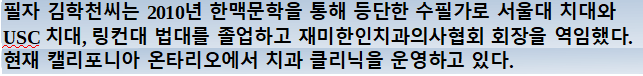미국은 대선을 향한 레이스가 한참인 반면 한국은 총선이 끝났다.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간의 공방도 그렇지만 각종 여론조사들의 결과가 유권자들을 더 혼란케한다. 여론조사가 통계학이라는 과학적 산물이긴 해도 그 방식에 숨어있는 허점들 때문이다.
미국은 대선을 향한 레이스가 한참인 반면 한국은 총선이 끝났다.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간의 공방도 그렇지만 각종 여론조사들의 결과가 유권자들을 더 혼란케한다. 여론조사가 통계학이라는 과학적 산물이긴 해도 그 방식에 숨어있는 허점들 때문이다.
1932년 아이오와 주무장관 (州務長官: Secretary of State)선거가 열렸다. 남북전쟁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이 승리한 적이 없는 이 곳에서 밥콕 밀러(Babcock Miller)라는 여성 후보가 나왔다. 공화당과 평생 싸우다 사망한 남편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나온 그녀는 대학 교수인 사위에게 유세 도움을 청했다.
그는 자신 나름대로 개발한 논리적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낸 것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그 결과 아이오와주 최초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 역사를 이끌어냈다. 그 사위 이름은 조지 갤럽(George Gallup)이었다.
이 후 갤럽은 여론조사연구소를 설립했다. 당시 최고 여론조사 기관은 리터러리 다이제스트(The Literary Digest)였다. 4년 후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알프레드 랜던의 대선이 벌어졌다. 다이제스트는 자동차등록부와 전화번호부를 이용해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55대41로 공화당의 랜던이 이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갤럽은 자신의 방법으로 조사해 루스벨트가 이긴다고 예측했다. 그 결과 예상대로 61대37로 루스벨트가 승리했다. 다이제스트가 이용한 자동차와 전화번호부는 당시 이를 소유할 수 있었던 부유층들만의 의견을 듣고 서민 유권자의 의견은 배제되는 실수를 범했던 것이다. 망신살이 뻗친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2년 뒤 폐간했다.
하지만 이 후 승승장구하던 갤럽도 1948년 대선 예측에서 참담한 실패를 겪게 됐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많다. 그 중 하나가 ‘침묵의 나선’ 이론이다. 자신의 견해가 우세한 여론과 일치하면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침묵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소수 의견으로 드러나면 자칫 불이익이나 나쁜 평가를 받거나 혹은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리고는 숨겼던 속내를 투표장에서 드러내기 때문이다. ‘샤이(Shy) 표심’이다.
이 이론의 대표적인 사례가 ‘브래들리 효과’다. 1982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때다. 흑인과 백인 후보가 맞대결한 이 선거에서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서 앞섰던 흑인 후보 토머스 브래들리가 개표 결과 백인 후보 듀크미지언에게 패했다. 이는 백인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인종적 편견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답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과학적으로 보이는 여론조사결과도 이외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오류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그런 여러 요인들을 생략한 채 숫자만을 부각한다면 이는 더 이상 과학이 아닌 점술이 될 뿐,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신뢰성 조차 잃게 해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아무튼 이제 한국의 선거는 끝났다. 혐오로 세(勢)를 불리고 보복으로 갚는 정치문화가 반복된다면 더 이상의 진일보는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 다른 적대감만을 양산하는 악순환은 자명한 일 일게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저서 ‘트러스트’에서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며 미래와 경쟁력의 열쇠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는 바로 이 상호간의 신뢰에 따른 수준 차이라고 했으니 이제 대선으로 향하는 미국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