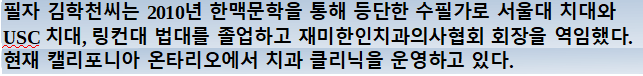1776년은 역사적으로 정치와 경제에서 상당히 뜻 깊은 해였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해였으며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출간한 해여서다.
17세기 잉글랜드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후사없이 서거하자 친척인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1세가 잉글랜드 왕을 겸하게 됐다. 하지만 ‘왕권이 법보다 위(왕권신수설)’이라는 그와 시민이 뽑은 의회가 국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회파 사이에서 마찰이 심했다.
이어 즉위한 찰스 1세는 절대주의를 한층 더 강화하고 청교도를 탄압하는가 하면 장로교가 우세한 스코틀랜드 왕국에 영국국교를 강요하자 잉글랜드 내전이 시작됐다. 그 결과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의회파가 승리하면서 왕은 참수되고 새로운 공화제가 실시되었지만 잠시뿐 다시 왕정으로 되돌아가면서 수세에 몰리게 된린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향했다.
해서 미국은 흔히 영국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스코틀랜드와 상당히 연관이 깊다. 미국의 제도가 여러면에서 스코틀랜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국국교가 아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이룩한 새로운 국가 이념은 물론 교육면에서도 스코틀랜드 방식을 택했으며 정치 체제 또한 왕정이 아닌 공화정을 택한 것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제도와 정신을 실천한 프린스턴 대학 출신의 26대 대통령 윌슨을 비롯해서 FDR로 유명한 32대 대통령 루스벨트의 모계나 카네기 등이 스코틀랜드 후손이었다.
영국은 얼마 후 기술혁신에 빛나는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화를 이룩하면서 부국의 길로 가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무력으로 전세계에 식민지 제국을 세우고 착취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자리에 앉게 되었던 거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와 그의 후계들은 이러한 무력에 의한 방법이 아닌 자유무역에 의한 시장개척을 내세웠으니 이것이 자유통상의 개념이었다. 해서 아담스미스 이전은 무력에 의한 통상이라면 그 이후엔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일찌기 철학자 칸트(Kant)도 이러한 무력에 의한 정복 전쟁과 무역을 혐오하고 내세운 이론이 ‘세계 평화론’이다.
그 첫째가 공화제 국가, 둘째가 자유국가들의 모임인 연합체인데 이를 이끌어 갈 구심점의 나라가 있어야 하며, 셋째가 이들 나라들이 자유로이 무역할 수 있는 자유통상을 설파하였다. 그리고 그가 염두에 둔 그 리더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 당시 미국은 오늘날과 달리 겨우 13개주만을 연맹한 작은 나라였을 뿐이었지만 앞으로의 무한한 가능성을 예측하였던 것이다.
이들 아담 스미스와 칸트 또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었다. 그러고보면 혹여 본국 스코틀랜드가 이루지 못했던 독립을 신대륙에서나마 어렴푸시 꿈꾸어보려는 기대였던 거라면 지나친 이야기일까?
아무튼 이들의 정신과 노력으로 미국은 마침내 1776년 독립을 선언한 후 힘겨운 전쟁을 거쳐 1789년에 최초의 성문헌법을 완성하고 이에 따라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기원 후 최초의 공화제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미국 ‘독립선언문’은 전문(前文)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동등하며, 신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 권리는 곧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이다.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국민은 정부를 조직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에서 배제되었던 노예 흑인들의 해방은 남북전쟁을 거쳐 1863년에 선언되었고 1865년 텍사스주를 마지막으로 흑인 노예제가 끝났지만 완전한 실천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오늘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인종차별의 그림자. 그럼에도 미국은 루즈벨트가 ‘우리만 행복하고 풍요로운 오아시스가 되려 해선 미국은 결코 존속할 수 없다’고 역설했고 칸트가 말한 ‘지구상의 모든 표면은 그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다’는 기치 아래 자유독립의 정신을 매년 재선언하고 ‘항해의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해 본다.
올해는 미국 독립기념 248주년이다. ‘God bless 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