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전쟁이 끝난 후 미국인들이 영국을 여행하면서 그곳 문물을 접하고 돌아와 뽐내면서 퍼뜨렸다고 하는 게 있다. 팁(Tip) 문화다. 영국 튜더왕조 시절 귀족 문화에서 시작됐다는 팁은 ‘신속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는 뜻의 ‘To Insure Promptitude’의 머리글자를 합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식으로는 서비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gratuity’라고도 한다.
하지만 서양인들이라고 모두 무조건 팁을 주는 건 아니다. 지난 해 영국의 시장 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업 YouGov에 흥미로운 기사가 난 적이 있었다. 팁 문화에 대한 유럽과 미국 사이에 확연히 차이나는 인식에 대한 것이었다.
유럽인들은 식당이나 미용실, 택시 기사 등의 기본 임금에는 서비스 요금이 포함돼 있는데 왜 팁을 따로 줘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더구나 대부분 유럽 국가는 종업원의 최저임금이 높기 때문에 별도로 팁을 줄 필요도 없고 설령 주더라도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무시한다. 따라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면 추가로 팁을 주는 것이고 아니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미안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다.
반면에 미국에선 서비스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주어야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는 10~15%이던 비율이 코비드 사태를 겪으며 20~30%, 심지어 45%까지 치솟는 ‘팁플레이션(Tip-flation)’이 일어나면서 ‘부당한 팁 문화’에 대한 피로감 호소가 늘어나고 있다. 아니 ‘통제 불능’ 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부담스러운 팁을 피해 패스트푸드점을 찾기도 하지만 이마저 무인 셀프 계산대(Kiosk)에서도 팁을 강요받는 실정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 식당 종업원들이 팁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임금이 팁을 받는다는 전제 아래 책정되기 때문이다. 팁이 종업원에게 부수입이 아니라 주수입의 일부가 되게끔 된 조치로 고용자가 임금 일정 부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게 허용한 셈이어서다. 이 조치가 대서양을 사이에 둔 유럽과 미국의 팁 문화에 차이를 만든 것이다.
미국에서는 약 500만 명이 팁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이 중 70%가 여성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는 노동자가 받는 팁을 ‘팁 크레디트’로 반영해 최저임금에서 제외한 만큼 급여로 지급하면 된다. 팁이 기본급의 일부인 것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선 ‘팁 크레디트’를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는 시간당 최저임금과 팁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캘리포니아 식당에서는 ‘건강관리 보안 조례’ 같은 명목으로 6%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슬그머니 부과한다. 차라리 음식 가격을 6% 올리는 것이 더 투명한 방식일텐데도 말이다.
그러자 지난 달 1일부터 ‘정크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발효됐다. 미국의 팁 문화가 더 이상 ‘호의’가 아닌 ‘강제’로 지극히 그악스러워지면서 종업원은 진상 손님에게도 웃음을 팔아야하고, 손님은 팁을 주면서도 눈치를 봐야 하는 매우 거북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서 일찌기 미국인을 우습게 보는 영국인들이 팁을 ‘미국의 최악 수출품’으로 꼽았고. 오래 전 NYT도 ‘수입된 악습 중 가장 사악한 것’이라고까지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팁이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변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유세에서 경쟁적으로 팁에 대한 면세 공약을 내놓고 있으면서다.
소비자는 서비스에 정성을 다하는 이들에게 팁을 아끼려할 리 없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하면 팁이 ‘강제적 권리요구’가 아닌 소비자의 ‘선택적 호의’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것일게다. 훌륭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때 흡족한 마음으로 주는 ‘gratuity’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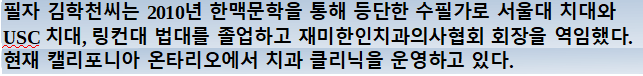
이전 칼럼 [김학천 타임스케치] XY 유전자 여자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