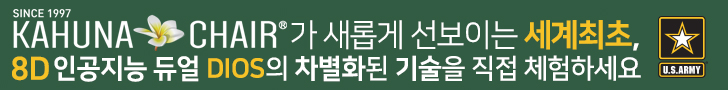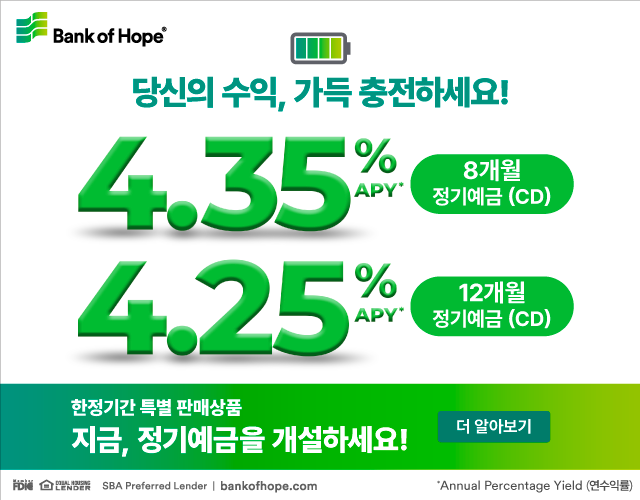1970년대 당시 청년문화의 상징인 소설가로 최고의 인기를 누린 작가하면 단연 고(故) 최인호 작가다.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단편소설 ‘벽구멍으로’ 글로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입선한 재원이었다. 헌데 신문사는 발표 후 수상식장에 교복 차림으로 나타난 그를 보고서야 고등학생임을 알게 되자 그의 이름만 내고 작품은 게재하지 않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이후 한국일보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그 첫 소설 원고는 소실되고 말았다고 한다.
이 후 수 많은 작품으로 우리 시대 대중 문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밀리언셀러 작가가 된 그는 침샘암 치료 중 항암제로 손톱이 변형되고 빠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손가락에 골무를 끼워가면서 작품에 몰두했다. 안타깝게도 2013년 가을, 세상을 떴다.
고(故) 최인호 작가의 걸출한 수많은 작품 중에서 최대의 히트작 ‘상도(商道)’를 빼놓을 수 없다. 오늘날의 기업인들이 사표로 삼을 만한 소설을 쓰겠다고 결심하고 집필한 이 소설은 힌국, 중국까지 수벡만 베스트셀러였다. 역관(譯官)을 꿈꿨으나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그 뜻을 접고 무역상인 의주(義州) 만상(灣商)의 말단 사환으로 들어가 대방(大房)에까지 오르고 조선 최고 거부로 성장하는 임상옥의 일대기였다. 드라마로도 나와 인기 방영됐지만 작가의 원작과는 사뭇 다르게 각색되어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청나라 상인들이 담합하여 턱없이 낮은 가격에 조선의 인삼을 사들이려는 음모를 꾸미자 임상옥이 ‘조선의 혼이 담긴 인삼을 헐값에 파느니 차라리 모두 없애버리겠다’며 인삼 상자를 쌓아놓고 불태우는 장면이다. 결국 청나라 상인들은 이에 굴복해 담합을 풀고 임상옥이 요구한 제 가격에 인삼을 모두 구매하게 되면서 조선 인삼의 긍지와 가치를 한층 높혔다.
지난 7일 캘리포니아주가 ‘한국 인삼의 날(K-Ginseng Day)’ 기념일 제정을 공식적으로 의결했다. 한글날, 태권도의 날, 한복의 날 제정에 이은 반가운 성과다. 한 가지 아쉽다면 명칭 ‘K-Ginseng’이라는 표현이다.
많이들 ‘Ginseng’이란 표기를 일본말로 알고 있지만 실은 고려 인삼이 중국에 수출된 이후 만들어졌다. 중국은 고려인삼을 우리의 고유어 ‘심’과 발음이 비슷한 한자 ‘參(삼)’으로 표기했고 중국을 통해 서양에 수출될 때 인삼의 중국어 발음인 ‘런센’이 ‘Ginseng’으로 변화한 것을 러시아 과학자가 세계식물학회에 처음으로 인삼 학명에 등록하면서 영문표기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이제 인삼에 붙여진 남의 이름에서 우리의 ‘심’ 혹은 ‘인삼’인 본래의 이름으로 되찾아야져야 한다는 얘기가 새삼스럽지만은 않다. 언뜻 모 일간지 에디터인 영국인 짐 불리(Jim Bulley)의 한국음식 명칭에 대한 기고를 읽으며 공감했던 적이 생각난다.
그는 글에서 마치 ‘타코(Taco)’를 ‘Mexican sandwiches’라고 하지 않고, ‘크레페(Crêpe)’를 ‘French pancakes’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힌국음식 명칭 자체 또한 한국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전’은 ‘전’으로 불려야 하지 ‘Korean Pizza’ 가 아니며, 김밥은 ‘Korean Sushi’가 아닌 그냥 ‘김밥’으로, 막걸리는 ‘Korean Wine’이 아닌 ‘막걸리’ 그 자체로 불려야 한다고 했다. 단지 그런 영문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으로 필요한 것이라 했다.
이미 우리는 더 이상 태권도를 ‘Korean Karate’라고 하지 않고 씨름을 ‘Korean Sumou’ 라고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직도 어색한 남의 이름을 빌려 부르는 우리의 것들에게도 원래의 이름을 제대로 되찾아 줌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것들과 동등한 자격을 갖게 하고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