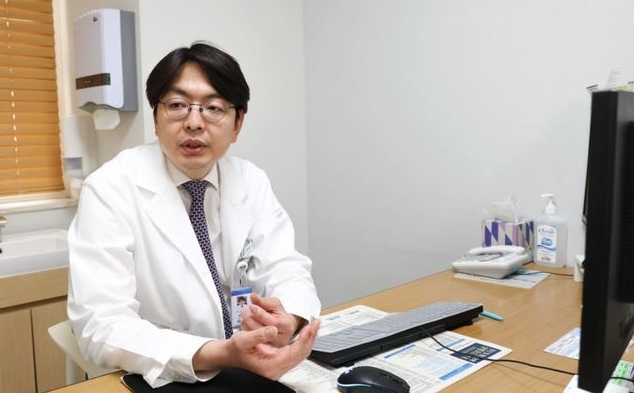
공황발작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느껴지고 지하철, 버스, 항공기 등과 같이 갑갑한 환경이 꺼려진다면 공황장애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공황장애란 갑작스러운 불안감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다.
공황장애 유병률은 평생 1~4%로 정신질환 중 높은 편에 속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황장애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2014년 9만 3000명에서 2020년 19만 6066명으로 6년간 무려 110% 증가했다. 공황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면서 진료를 받는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백명재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젊은층 공황장애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어지러움 등 신체증상이 갑자기, 극심하게 나타나는 공황발작이 공황장애의 주요 증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황발작이 나타나면 대다수 사람들은 심장마비, 호흡정지, 뇌출혈 등 심각한 질환으로 오인해 반복적으로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관련 검사를 받지만 뚜렷한 신체적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나타나는 극단적인 신체 증상이 반복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 환자의 절반 정도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는 특성을 보이지만,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뚜렷한 유발 요인 없이 나타나기도 한다.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등의 불균형, 뇌기능의 이상이 발병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백 교수는 “공황발작 뿐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공황발작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예기불안, 지하철, 버스 등과 같이 갑갑한 환경을 회피하는 증상을 보인다면 공황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며 “공황장애 치료법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만성적이고 증상이 악화된다는 질환의 특성은 변하지 않아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이외에도 꾸준한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성기 증상의 경우 약물치료에 비교적 잘 반응한다. 약물치료를 중단하면 잦은 공황발작을 재경험하다보니 장기간 약물치료를 유지하기도 한다. 심리치료와 스트레스 관리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심리치료 중 효과가 좋은 인지행동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점차 늘고 있다.
백 교수는 “치료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물론 증상이 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근육의 이완 효과가 있는 복식호흡, 필라테스 등의 운동을 권장한다”며 “공황 증상은 이렇게 살면 나중에 실제 몸이 나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알람’으로 인식하고 몸과 마음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