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남부에 있는 대도시 슈투트가르트는 독일의 자동차 역사를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도시로써 메르세데스-벤츠와 포르쉐의 본사가 있고 두 곳 모두 자사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도 있다. 특히 포르쉐의 경우 그 로고에 슈투트가르트의 문장과 지명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자랑거리는 또 있다. ‘막스 플랑크연구소’다. 1911년 신학자 하르나크가 ‘독일의 강한 두 기둥은 군사력과 학문’이라며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연구기관을 세우자고 황제를 설득해 ‘카이저 빌헬름 학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다가 전후 학회 소속의 29개 연구소 중심으로 천재 물리학자 이름을 딴 ‘막스 플랑크 협회’로 바뀌었는데 이는 독일만이 아닌 세계 최고의 기초과학 연구기관이 되었다.
기초과학 연구기관이지만 자연과학에만 한정하지 않고 생명과학, 법률, 역사,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로까지 확장되어 독일은 물론 미국 등에 86개의 연구소를 산하에 두고 소속 과학자와 연구원 및 박사과정 학생, 직원 등 30,000명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이다.
그리고 막스 플랑크, 아인슈타인을 비롯해 40여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 ‘노벨상 사관학교’로도 불린다. 참고로 아시아 지부는 현재 포스텍에 있다.
흔히 ‘막스 플랑크는 두 가지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들 말한다. 그 하나가 양자 역학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인슈타인이다. 물질과 에너지의 최소 단위 중 하나인 양자가 플랑크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1905년 베른 특허청의 공무원이던 아인슈타인이 논문을 발표했을 때 그 진가를 알아보고 대학교수로 발돋음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 역시 플랑크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플랑크의 에너지의 양자화는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두 천재는 음악도 좋아해 함께 연주도 했다고 한다.
나치가 유대인 과학자들을 공격하자 막스 플랑크는 ‘우리는 유대인들의 우수한 머리가 과학 작업에 필요하다’고 히틀러를 설득하려 했지만 ‘아무리 똑똑해도 유대인은 유대인일 뿐’이라며 완고하게 거절당했다는 일화도 있다.
아무튼 이 기관이 성공하게 된 비결은 ‘하르나크 원칙’에 있다고 한다. 하르나크가 100여 년 전 황제를 설득할 때 내세운 ‘연구의 독립성’ 전통이 이어진 때문이다. 말하자면 독일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철저히 지켜 연구소가 자율적인 판단과 계획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과학자에게 단장을 맡기고 인사권과 예산을 일임하면서 스스로 연구를 이끌어가게 하고 기존 연구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성을 강조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한해 20억 유로에 달하는 운영자금의 90% 이상을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가 지원한다.
이런 연구소 단장에 한국의 차미영 KAIST 교수가 이번에 발탁되었다. 자유롭고 차별 없는 연구 문화전통으로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문호를 열고 이 연구소를 이끌어온 300여명의 연구단장 가운데 한국 국적 과학자로써는 처음이며 특히 여성이라는 점에서 그 뜻이 깊다.
글로벌 경제 패권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도 상업적이 아닌 순수 기초과학에 보다 더 많은 인적 물적 투자와 집중적인 육성이 절실한 과제로 보인다.
이러한 때에 날아든 낭보는 우리 모두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여 준다. 차 교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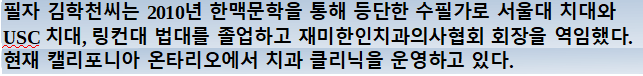
이전 칼럼 [김학천 타임스케치] M&M 초콜릿과 미국의 문화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