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인슈타인이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던 중 차장이 검표 하러 왔다. 헌데 주머니와 가방 모두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차장이 ‘모두가 아는 분이니 괜찮다’고 했다.
아인슈타인이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던 중 차장이 검표 하러 왔다. 헌데 주머니와 가방 모두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차장이 ‘모두가 아는 분이니 괜찮다’고 했다.
그럼에도 아인슈타인이 의자 밑까지 더듬으며 당황해하는 모습에 재차 걱정말라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표를 찾아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거 아니오?’.
아인슈타인의 기억력에 대한 유명한 우스개 일화지만 사람은 누구나 종종 무언가 잊는다.
‘업은 아기 3년 찾는다’는 속담처럼 안경을 쓰고도, 혹은 핸드폰을 손에 든 채 찾는 경우도 있는 가하면 무엇을 어디다 두었는지 아예 까맣게 잊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 혹시 건망증이 심해져 치매로 가는 건 아닌가 염려하기도 한다.
허나 일반적인 망각을 넘어선 알츠하이머같은 기억력 장애는 문제가 되겠지만 일상적인 망각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과거 신경과학 분야에서 망각은 기억 시스템의 결함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일상적 망각은 기억의 실패나 뇌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뇌가 하는 기본적인 일로 정상적인 기억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연구자들은 얼룩말 무늬를 가진 열대어 지브라피쉬(Zebrafish)를 대상으로 실험해 보았다. 이 물고기가 새끼였을 때엔 몸이 투명해 죽이지 않고도 생체 변화를 자세히 관찰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다. 헌데 이 물고기의 뇌에서는 사람처럼 ‘기억’과 ‘망각’이라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다. 해서 이 물고기가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일부 기억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발견했는데 ‘망각’만을 담당하는 신경 메커니즘이 따로 있었던 거였다.
이처럼 기억은 모든 것을 사진처럼 보관하지 않고 망각을 통해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버리고 핵심만을 저장한다. 그러니 건망증은 ‘두뇌가 건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사소한 건 잊어야 오히려 두뇌에 좋다’고 한다.
‘적당한 망각’이 있어야 다양하게 변하는 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불필요한 정보를 버리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분노나 슬픔 등의 고통스러운 감정도 지속되지 않기 때문인 거다.
우리의 뇌는 하루에만도 수십만 개의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중에는 중요한 정보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정보들도 많다. 예를 들어 아침 출근 때 지나친 다른 차나 건물등의 모양이라든지 마켓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앞 사람의 셔츠 색깔과 같은 정보 말이다.
이러한 정보들이 버려지지 않고 뇌에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될까? 이는 소설 ‘기억의 천재 푸네스 (Funes)’에 그 답이 있다. 절대 기억력을 가진 주인공이 기억에 매몰되어 고통스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자택으로 가져간 기밀문서 유출에 대한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내놓은 수사보고서가 미 정가를 흔들고 있다. 허 특검은 지난해 10월 바이든을 백악관에서 조사했다. 그리고 수사의 결론은 ‘중범죄 혐의 없음’이었다.
헌데 문제는 그 사유에서 발생했다. 보고서에 쓰인 ‘의사소통이 느리고…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며 ‘기소하더라도 대통령 변호사들은 배심원단에게 바이든을 ‘선하지만 기억력은 나쁜 노인’으로 묘사할 것이고 결국 유죄평결을 받기 어렵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체코-프랑스 소설가 밀란 쿤데라 (Milan Kundera)는 그의 저서에서 ‘권력에 맞서는 인간의 투쟁은 망각에 맞서는 기억의 투쟁’이라고 했다.
그럼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는 선한 노인의 권력에 대한 재도전은 이제 그 반대로 ‘기억에 대한 망각의 투쟁’으로 들어서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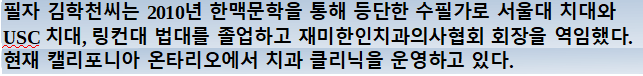
이전 칼럼 [김학천 타임스케치] 사랑한다 아낌 없이 말하는 날
이전 칼럼 [김학천 타임스케치]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관련기사 바이든 기억력, 중대한 한계 도달 특검보고서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