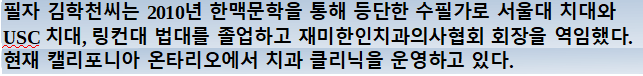어느 날 일곱 살 먹은 아이가 애타게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이 아주 늦어서야 아빠가 돌아왔다. 아이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가 반기지만 하루 일과에 너무 지친 아빠는 달갑지 않다.
어느 날 일곱 살 먹은 아이가 애타게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이 아주 늦어서야 아빠가 돌아왔다. 아이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가 반기지만 하루 일과에 너무 지친 아빠는 달갑지 않다.
퉁명스럽게 ‘오냐’하고 지나치려는 데 아이는 뒤따라가며 묻는다.
‘아빠,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아빠는 한 시간에 얼마를 벌어요?’ 아빠는 짜증이 나다 못해 화가 나서 ‘네가 그런 건 알아서 뭐해?’하며 큰소리를 냈다.
그래도 아이는 다시 졸랐다. 그러자 아빠는 ‘한 시간에 20불이다. 이제 그만 가서 자라’ 하자 아이가 10불 만 달라고 했다. 이 소리에 그만 화가 더 치민 아빠는 ‘너는 매일같이 쓸데없이 장난감이나 살 생각을 하고 있냐?’며 야단쳤다. 아이는 무안하고 겁도 나고 해서 울먹이며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잠시 후 아빠는 아이한테 좀 심했던 게 아닌가 후회되면서 아들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궁금했다. 정말로 뭔가 필요했던 건 아날까 하는 의구심도 생겼다. 평소엔 그렇지 않던 아이인데 오늘은 좀 달랐기 때문이었다.
아빠는 아이의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며 ‘자냐?’하니 아이는 반가운 듯이 자리에서 뛰쳐나와 방문을 열었다. ‘아까는 내가 좀 심했던 것 같다. 오늘 너무 피곤하다 보니 짜증이 나서 그랬다. 미안하구나. 그래 10불을 주마.’ 아이는 너무 기뻐서 얼른 돈을 받아들고는 제 침대로 가서 베개 밑에서 구겨진 또 다른 10불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이를 보자 아빠는 도로 화가 치밀었다. ‘아니, 돈이 있으면서도 또 달라고 했던 거냐?’ 아이는 겁을 먹으며 말했다. ‘이제 20불 있으니 아빠의 시간을 살 수 있겠네요. 아빠는 한 시간에 20불이라고 했죠? 내일 저녁에 일찍 들어와 줄래요? 제가 아빠의 한 시간을 사려고요.’ 아빠는 할 말을 잃고 아이를 안았다. 갑자기 아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디선가 읽은 이야기지만 아버지에 대한 가족들의 그리움이 묻어난다. 오늘날을 아버지의 부재(不在)사회라고 한다. 이는 단지 가부장제가 무너지거나 여권 신장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 현상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아버지를 뜻하는 한자 아비 부(父) 자는 도끼 부(斧) 자와 그 뿌리를 같이한다. 그리고 도끼는 노동과 권위를 상징한다. 하지만 이제 권위는 커녕 직장일에 매이고 상사와 회사에 눌려 아버지들은 정신적, 심적으로 왜소해지면서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고독한 이름, 아버지. 그렇게 됐다.
김현승 시인은 이렇게 읊었다.
‘바쁜 사람들도/굳센 사람들도/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어린 것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라고.
이채 시인 또한 아버지는
‘무겁다 한들 내려 놓을 수도 없는/힘들다 한들 마다 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에 울 수도 없어 목이 멜 뿐’이라고 했다.
불가(佛家)에서 부모와 자식은 전생에 빚진 관계라고 말한다. 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빚이 얼마인지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자식은 그 빚을 받기 위해 그 부모를 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서로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다.
허나 꼭 그래서 만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가는 매 순간마다 가족들이 함께 해야 할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시 돌아다봄이 어떨는지. 잃은 시간은 다시 안 오지만 같이 한 시간 만큼만 그리움은 남는다고 하지 않던가!
6월은 아버지의 달이자 마침 어제는 아버지의 날. 모든 아버지에게 박수와 응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