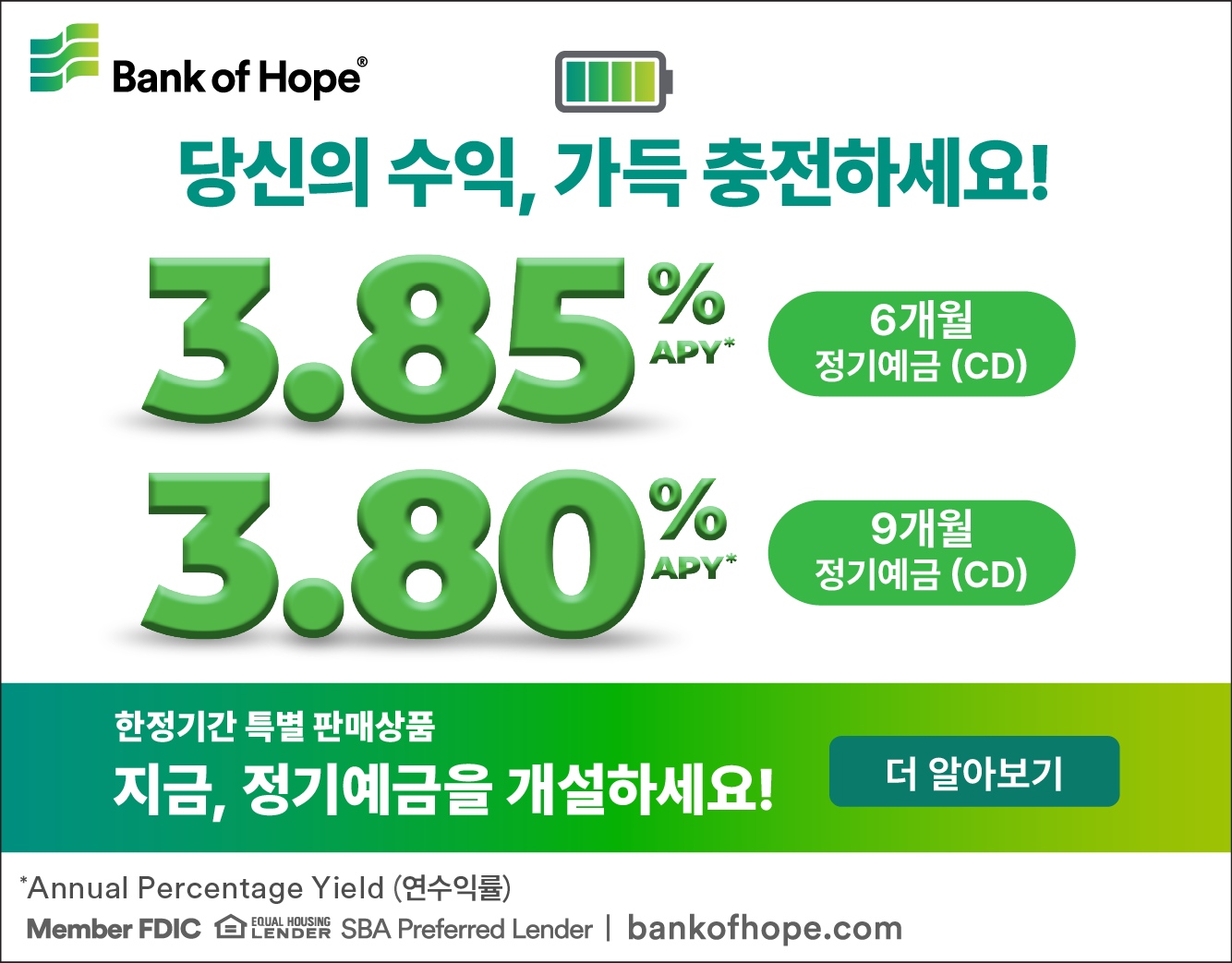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무역협정의 기본 틀에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상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규정할 원산지 기준이 “이미 어렵게 타결된 무역협정을 뒤흔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정 국가에서 수출되더라도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40%의 고율 특별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웬디 커틀러 부소장은 “이건 잠복해 있는 핵심 이슈”라며 “겉으로는 기술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 전체를 좌우할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태국·캄보디아·베트남 등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기존의 초고율 관세를 일부 완화하고, 19~20% 수준의 과세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외국산 부품이나 소재 비중이 30%를 넘으면 ‘우회수출’로 간주해 특별관세를 부과하는 ‘원산지 기준 30% 룰’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상당수의 부품과 소재는 중국산이다. 나사를 고정하는 금속과 나무를 잇는 접착제, 스마트폰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까지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어 대부분의 동남아 제조업체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미국의 새로운 원산지 규칙이 자국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지만, 주요 수출 시장은 미국이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주재 미국상공회의소 대표 시오반 대스는 “이번 협정을 통해 공급망 이동과 관세 적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외국산 부품이나 소재’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외국 자본이 투자한 공장, 외국 브랜드의 기계, 외국인 근로자가 생산에 참여한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 많은 중국 기업이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이전했지만, 현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컨설팅기업 APAC어드바이저스의 스티브 오큰 대표는 “이건 사실상 미국 수출품을 전담 감시할 새로운 기관을 하나 만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동남아 각국 정부는 딜레마에 놓였다. 명확한 원산지 기준 없이 협정을 서두를 수 없지만, 지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했던 초고율 관세 부활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동남아 국가들은 반도체·기계·가구·의약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개별 산업 관세 협상도 병행해야 한다.
무역 전문가 데버러 엘름스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며 “아무리 협상력을 갖고 있다 해도, 결국 미국과 중국에 비하면 경제 규모가 너무 작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