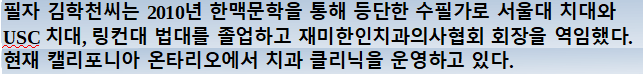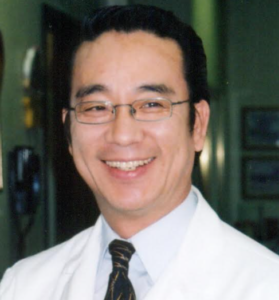 흔히 임금이 있는 곳을 가르키는 궁궐 안에는 여러가지 궁(宮)이 있다.
흔히 임금이 있는 곳을 가르키는 궁궐 안에는 여러가지 궁(宮)이 있다.
왕이 정사를 돌보고 거처하는 정궁(正宮), 상왕이나 대왕대비가 머물거나 왕이나 왕세자 비를 맞아들이기 위한 별궁(別宮), 정궁에 변고가 있거나 왕들의 요양을 위해 잠정적으로 머무는 행궁(行宮) 혹은 이궁(離宮)이 있다. 이 중 정궁은 그야말로 왕실의 으뜸 궁궐이고 이궁은 일종의 정궁을 보조하는 궁궐인 거다. 말하자면 경복궁은 정궁이고 창덕궁이나 덕수궁은 이궁인 격이다.
1104년, 고려 숙종이 나라에 여러 재난이 계속되자 이를 막기 위해 풍수지리설을 좇아 북악산 남쪽에 이궁(離宮)을 세웠다. 조선 개국 후 태조는 경복궁을 창건하고 이곳을 후원으로 사용했는데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던 터에 태종이 이곳 숲을 지나다 변을 당할 뻔 한 적도 있었다는 일화도 있다.
그러다가 일제(日帝)는 조선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을 가로막아 총독 관저를 짓고 뒤편에 총독 관사를 두었다. 북악산과 남산을 잇는 산의 정기가 흐르는 줄기를 잘라 왕실의 기(氣)와 민족정기를 말살하려 했던 것이라 한다.
이 후 해방이 되자 미 군정 사령관 관사로 사용됐다가 1948년 정부 수립 후엔 이승만 대통령이 사용하면서 옛 이름대로 다시 경무대로 불렀고 4·19혁명 뒤 윤보선 대통령은 관저 지붕의 푸른 기와에서 이름을 따 청와대(靑瓦臺)로 바꿨다.
헌데 지금의 청와대는 불통과 단절 그리고 왕조시대를 연상케 할 정도로 봉건적이고 폐쇄적인 ‘구중궁궐’ 의 권위주의 이미지를 풍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우선 현재의 청와대는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들어졌는데 어설픈 양식이라는 비판이 따랐다. 한국적으로 하기 위해 목조 흉내를 냈지만 콘크리트 건물에 색을 입히고 그 위에 개량 기와를 얹은 족보 없는 건물이란 이유다. 해서 당시 건축계에서는 이를 ‘박조(朴朝, 박정희와 조선시대 건축을 합친 말)건축’이라 부르며 조롱했다고 한다.

게다가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청와대 본관과 생활공간인 관저, 보좌관과 비서진이 근무하는 3개의 비서동, 취재진이 상주하는 춘추관 등이 모두 멀리 떨어져 있다. 대통령 관저는 본관에서 200m 정도 떨어져 있고 비서동에선 600m 이며 비서동은 직선 거리가 500m 정도나 되고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선 2개의 경비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15분-20분 정도 걸린다. 이 때문에 참모들이 하루 종일 대통령을 못 만나는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는지 관저에 있는지 잘 알기 어렵다고 한다.
내부는 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웅장한 본관 2층의 대통령 집무실은 규모부터 권위적이다. 운동장 만큼이나 크게 느껴지는 집무실에는 대통령이 사용하는 책상과 회의용 탁자뿐인데 출입문으로부터 책상까지의 거리가 15m나 된다. 해서 구조 자체가 사람을 주눅 들게 하다 보니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고위 관료가 뒷걸음질 쳐 나오다 넘어졌다 거나 너무 긴장해 오줌까지 쌌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라고 한다. 본관 전체 면적은 25평대 주거공간의 1,000배란 계산이다.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을 마주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거다. 해서 대통령과 참모진 간의 거리를 좁히는 실무형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대부분 민주주의 선진국에선 빠르고 편한 소통을 위해 대통령, 총리, 수상 등의 집무실과 참모실이 한데 붙어 있다.

백악관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와 보좌관들 사무실은 한 건물 한 층에 있다. 소위 말하는 ‘웨스트 윙(The West Wing)’이다. 대통령은 언제든 지척에 있는 참모들 사무실을 찾아 국정을 의논할 수 있고 오벌 오피스에서 뜰로 나가면 참모진 모두와도 만날 수 있는 개방형이다.
영국도 총리 집무실과 가족 주거공간, 비서실장실, 참모 사무실, 회의장 등이 모두 한 건물에 몰려 있다. 옆 건물에는 재무장관 집무실이 있는데 건물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 독일이나 일본도 총리 집무실과 참모들의 사무실이 한 건물에 있다.
이러한 여러 이유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청와대 이전을 단골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매번 수포로 돌아갔다. 헌데 이런 ‘900년 금단의 지역’이 며칠 후면 일반에 개방되고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으로 옮겨간다. 74년 만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새 집무실 명칭에 대한 관심도 또한 화제다. 주한 미군들은 한국어 지명을 자신들이 발음하기 쉽게 영어식으로 바꾸어 부르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동두천은 영문 이니셜로 TDC라고 하는 가하면 용산(龍山)은 한자 지명의 뜻을 따라 ‘드래건 힐(Dragon Hill)’로 부른다고 한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청와대(Blue House)를 가리켰던 ‘BH’대신 요즘은 ‘DH’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고 한다. 헌데 이것이 드래건힐(Dragon Hill)의 약자 DH인지 용산(龍山)과 청와대(Blue House)의 합성인 ‘DH’(Dragon House)의 DH인지 모르겠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 집’이라는 의미인 ‘피플스 하우스(People’s House)’ PH가 제안되기도 했다.
단어는 다르지만 백악관은 원래 ‘대통령의 집 (President’s House)’ PH 였다. 이름 그대로 대통령 집무실 겸 숙소였다. 1812년 영국과의 전쟁 때 영국군이 불을 질러 시커멓게 탄 외벽을 백색 석회로 단장하면서 1901년 리모델링을 한 후 공식 명칭으로 채택했다.
프랑스의 ‘엘리제(Élysée)궁’은 샹젤리제 거리와 가까워 붙은 이름이고, 영국 총리 집무실은 거리 이름대로 ‘다우닝가 10번지’다. 중국 주석의 거주 집무실은 ‘중난하이(中南海)’다. 베이징의 큰 호수인 ‘중해’와 ‘남해’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다.
러시아 대통령궁은 높은 성벽, 성채라는 뜻의 ‘크렘린(Kremlin)’이다. 북한 김일성의 집무실은 주석궁(금수산태양궁전)이었지만 김정일과 김정은은 노동당 1호 청사를 쓴다. 하지만 진짜 집무실은 지하 깊은 곳에 있다고 한다.
윈스턴 처칠이 ‘사람이 건물을 짓지만 건물은 사람을 만든다’고 했다. 이는 이제 대통령의 새 집무실도 시대에 걸맞게 권위적이고 비밀스런 위상보다는 개방적이고 실리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맞는 민주적 공간 구조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국민과 함께하며 국민을 섬기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리더십을 일깨우는 말일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