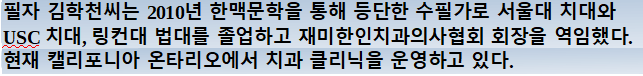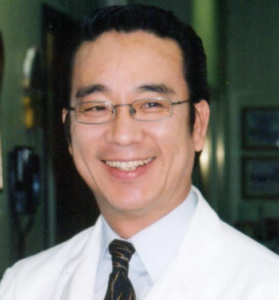 오래 전 후배가 개업한 병원 방문차 갔던 곳에서 함께 시가를 들러보던 중 때마침 서거(逝去)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고향 랜초 미라지(Rancho Mirage) 시(市)를 지나게 되었다. 길 곳곳에 조기(弔旗)가 걸려 있었는데 가로등 불빛이 없어 아마도 조문 중이어서 그런가 보다 했다.
오래 전 후배가 개업한 병원 방문차 갔던 곳에서 함께 시가를 들러보던 중 때마침 서거(逝去)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고향 랜초 미라지(Rancho Mirage) 시(市)를 지나게 되었다. 길 곳곳에 조기(弔旗)가 걸려 있었는데 가로등 불빛이 없어 아마도 조문 중이어서 그런가 보다 했다.
헌데 후배가 말하길 그곳 주민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자 청원해 가로등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특이한 발상이라 여겨지는 한편 문득 알퐁스 도데 (Alphonse Daudet)의 ‘별’ 이 생각났다.
산 위에서 홀로 양을 지키는 양치기 소년이 마음속으로 사모하는 주인집의 아름다운 딸이 어느 날 그를 찾아왔다가 폭우 때문에 집으로 가지 못하고 남게 된다. 소년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아가씨에게 별 이야기를 해준다.
‘성 자크의 길’이라 부르는 은하수며 목동들에게 시계노릇을 해주는 ‘오리온 별’과 별들의 횃불인 ‘쟝 드 밀랑 별(시리우스)’ 그리고 프로방스의 피에르를 쫓아가 칠 년 만에 한 번씩 결혼을 한다는 마글론이 목동의 별이라는 이야기까지.
그러는 사이 어느덧 밤은 깊어가고 피곤한 아가씨는 소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든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밤을 꼬빡 새운 소년은 ‘그래도 내 마음은 오직 아름다운 것만을 생각하게 해주는 맑은 밤하늘의 보호를 받아 성스럽고 순결한 생각을 잃지 않았습니다’고 독백한다.
그러면서 ‘저 숱한 별들 가운데 가장 가냘프고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내 어깨에 내려앉아 곱게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별은 인간의 희노애락 삶이 신화로 투영되어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지금이야 네비게이터를 이용하지만 옛날에는 별을 보고 가는 길을 읽었다. 그것 뿐인가. 별은 시인들에게는 삶을 표현하는 벗으로, 철학자들에게는 인생을 밝혀주는 스승이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에선 천문을, 점성학에선 미래를 읽어주는 우리 삶의 다기능 네비게이터였던 것이다.
헌데 하늘엔 별이 몇개나 있을까? 신화에 의하면 헤라클레스가 젖을 먹다가 흘린 것이 영어로 Milky way, 우리말로 은하수다. 우리 태양계가 자리잡은 은하수같은 이런 은하가 우주에는 무수히 많다. 은하는 적으면 100만 개, 많으면 100조 개나 되는 별들의 무리인데 인간이 관측 가능한 우주에만 1,700억 개가 넘는 은하가 있다니 어림잡아 모두 1경 (1조의 1만 배)개 정도인 셈인데 상상조차 불가능하다.
그러니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말한 ‘우주가 거대한 바다라면 인류는 아직 발가락만 조금 적셨을 뿐’이라는 말 또한 실감이 나질 않는다.

그럼에도 별에 다가가려는 인간의 호기심과 도전은 그치지 않아 1610년 갈릴레오가 인류 처음으로 은하수를 바라본 것을 시작으로 1990년 허블 망원경을 쏘아 올려 지난 30년간 수많은 우주 정보를 제공받았다. 하지만 이는 주로 가시광선을 기반으로 한 만큼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기엔 부족한 점이 많았다.
드디어 지난 성탄절에 발사된 최첨단의 적외선을 기반으로하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이 보내 온 첫 우주 관측 사진의 경이로운 모습이 공개되면서 우주의 탄생과 진화,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기대로 천문학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 망원경은 근적외선 및 중적외선 파장을 포착할 수 있어 해상도가 허블보다 100배나 높고 무엇보다 138억 년 전 빅뱅(대폭발)로 시작된 우주의 태초의 빛까지 관찰되었다니 말이다.
이제 태초의 빛도 알아내며 우주 탄생의 비밀에 접근하는 수준에 이른 인류는 JWST에 이어 새로운 차원의 중력파 우주망원경도 구상중이라 한다. 헌데 이 JWST은 NASA 2대 국장이었던 국무부 차관 제임스 웹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우주 탐사가 예산 낭비라는 정치권의 공세를 막아내며 무려 2,000억 달러에 이르는 아폴로 계획을 탄생시킨 그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서였다.
밤하늘의 별들 중엔 갖가지 색깔의 별들이 있다.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등. 그 중 어두운 부분은 까만색 별이어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빛을 내서 보이려면 누군가 그리워해야 하고 그러면 밝은 색의 별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비로소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허블이나 웹 망원경으로도 잡히지 않는 별인 것이다.
관련기사[김학천 칼럼(60)] 145년 꿈쩍않던 윔블던의 변화 테니스에 인생 있다
관련기사 [김학천 칼럼(59)]수학자와 시인: 신은 수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