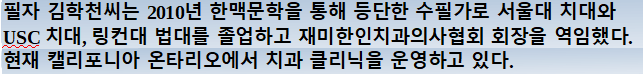교통경찰이 과속으로 달리는 차를 발견하고 쫓아가 세웠다. 안에 급박한 산모가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찰은 그 차를 호위하여 인근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그리고는 돌아와 운전자에게 과속 티켓을 끊었다.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이겠지만 준법과 봉사 사이에서 슬기롭고 바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말한 것일게다.
교통경찰이 과속으로 달리는 차를 발견하고 쫓아가 세웠다. 안에 급박한 산모가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찰은 그 차를 호위하여 인근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그리고는 돌아와 운전자에게 과속 티켓을 끊었다.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이겠지만 준법과 봉사 사이에서 슬기롭고 바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말한 것일게다.
헌데 이와 유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었다.
1930년 뉴욕 법정에 한 노인이 세워졌다. 굶주림에 배가 고파 빵을 훔친 혐의였다. 방청석안의 모두가 동정어린 마음으로 판사의 온정을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판사는 그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 법정은 잠시 술렁였다.
판사는 말을 이었다.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것은 비단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곤궁한 노인을 돕지 못한 우리 모두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도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걷은 57달러 50센트 중 벌금 1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를 노인에게 주었다. 피오렐로 라과디아 치안판사였다. 이 판결은 법치로 정의를 지킨 사례로 꼽힌다. 훗날 그는 뉴욕시장을 3번 연임했고 맨해튼 인근 공항은 그의 이름을 따라 ‘라과디아 공항’으로 명명되어 존경을 표했다.
역사 속엔 이러한 일반 판사들뿐만 아니라 연방 대법관들 중에도 대중의 마음을 흔든 판결을 내린 이들이 많다. 물론 흑인의 인권과 여성의 권리 등에 대한 과오도 있었으나 자신들의 실책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핵심을 잃지 않으려 끊임없이 노력했다.
이 때문에 9명으로 구성된 미국의 연방대법관은 ‘시대의 지성이자 양심’으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Justice’라 불리운다. 해서 미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연방대법관은 늘 상위권이었다.
헌데 근래 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법원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미국인은 25%에 그쳤다. ‘지혜의 아홉 기둥’으로 불리는 대법원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까? 사법부의 다른 법관들과 달리 이들을 구속하는 명문화된 규범이 없다보니 정치적으로 좌우되거나 부패와 부도덕으로 얼룩져 그런 건 아닐는지.
근자에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후원자로 부터 받은 화려한 각종 향응리스트로 말이 많다. 게다가 이에 대한 해명조차 구차하기 이를 데 없다. 이를 기화로 또 다른 일부 대법관의 추문과 함께 여론이 악화하자 떠밀리듯 연방대법원이 지난 13일 처음으로 자체적인 윤리 강령을 채택했다.
하지만 강제수단이 불분명한 탓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동 규칙들을 판단하는 주체가 대법관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부패한 재판관에 대한 유명한 일화를 상기해야할 것 같다.
고대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왕 시대에 부패한 재판관 시삼네스에 관한 참혹한 이야기다. 캄비세스 왕은 시삼네스의 살가죽을 벗겨내고 그것으로 가죽끈을 만들어 그가 앉아 재판하던 의자에 두르게 하고는 그의 아들을 앉혀 재판을 잇게 하였다고 한다.
재판관의 판결은 곧 법으로서 사람들의 일상을 규정하는 힘으로, 부정하고 부도덕하게 법에 어긋난 판결을 하는 것은 곧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재판관의 부패는 그만큼 치명적이고 무거운 범죄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함이였을게다.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극복을 위해 입법한 뉴딜 정책을 연방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시했을 때 내뱉은 탄식이 떠오른다. ‘아홉 명의 늙은이가 나라를 망치는구나!’ 지금도 맞는 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