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이 근대 프랑스를 만들었다면, 오늘의 프랑스는 ’68혁명’에 의했다고 한다.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이 근대 프랑스를 만들었다면, 오늘의 프랑스는 ’68혁명’에 의했다고 한다.
68혁명은1968년 5월,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회변혁운동이다. 그 해 3월 프랑스 파리 낭테르 대학에서 남자 기숙사는 여학생이 출입할 수 있으나 여학생 기숙사에 남학생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집회가 시작되었다.
2개월 넘게 지속되자 당국은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낭테르대를 임시 폐교하고 학생들이 거리로 내몰리면서 시위는 남녀 평등과 여성해방, 미국의 베트남 침공에 대한 반전 등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었다. 여기에 노동자 파업까지 연합되면서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68혁명’의 요구 사항들이 제도화되며 프랑스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거다.
68혁명과 발맞춰 같은 해 미국, 독일, 스페인, 일본 등 세계의 젊은이들을 저항과 해방의 열망으로 들끓게 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그 해 4월 뉴욕 컬럼비아대 학생들이 베트남전에 항의하며 캠퍼스 건물 5곳을 점거하고 반전 시위를 벌이다 경찰 수천명이 캠퍼스에 진입해 700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미국사회에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시위를 벌이며 목소리를 내 ‘저항과 반전의 역사를 가진 학교’라고 불리는 컬럼비아대가 다시금 가자지구 전쟁을 규탄하는 반전 운동에 불씨를 붙이면서 베트남전 이후 56년 만에 다시 ‘저항하는 젊은 피’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이들이 앞장선 반전 시위는 수 주째 이어지면서 80개 이상의 전국 대학으로 번져 심화되고 있다. 이에 언론들은 ’1968년 반전운동의 유령이 돌아왔다’고 표현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 베트남전쟁에 반발한 대학생들의 시위가 시민들의 반전 의식을 일깨웠던 그때와 닮았다는 뜻이다.
헌데 가자지구 전쟁 규탄에 대한 미 대학가 소요사태를 두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친이스라엘 대 친팔레스타인 구도로 대비시키는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 유럽의 많은 대학을 휩쓸고 있는 반전 시위 현장에는 여러 시각이 혼재돼 있다. 친, 반 유대주의, 친, 반 시온주의 그리고 친, 반 팔레스타인 주의 등이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수천 년에 걸쳐 유대인, 팔레스타인인, 아랍인 등 많은 민족이 공생하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시오니즘으로 모여들어 건국한 후 영토를 넓히기 위해 팽창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에 반대하는 반 시오니즘, 유대인이 국가가 필요한 것처럼 팔레스타인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친 팔레스타인주의 등과 충돌이 야기되었다.
문제는 모든 유대인이 시온주의자인 것은 아니며 반대로 시온주의자 중에는 유대인이 아닌 경우도 있어 이 모든 민족과 주의가 이해관계에 따라 어지럽게 얽혀 있는데 언론들이 대학가 운동을 ‘친 이스라엘 대 친 팔레스타인’의 단순 흑백논리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관계도 잘못됐다는 얘기다.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데도 법이 필요한데 국제법이란 것이 모든 이들에 권리가 똑같이 적용되지 못하고 강자와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기 마련이다. 그런 역사를 우리는 이미 스페인의 정복사에서 그리고 미 서부개척사에서 ‘명백한 운명’이라는 정복자의 권리주장에서 보았듯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모양새다.
헌데 68혁명 당시 프랑스 드골 정권이 이듬해 국민투표에서 패배했고 미군 파병을 결정했던 존슨 전 대통령 또한 재선에 불출마해야 했던 바, ‘돌아온 1968년 반전운동의 유령’이란 것이 이것까지도 말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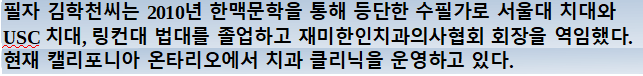
이전 칼럼 [김학천 타임스케치] 기업 사냥꾼과 하이브 사태
이전 칼럼 [김학천 타임스케치] 트럼프의 허시머니, 냄새가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