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말은 표현의 어휘가 참으로 다양하다. 같은 빨간색이라도 새빨간, 짙빨간, 붉은, 불그스름, 불그스레 등 수 없이 많다. 가족관계 호칭은 또 어떤가? 형과 동생, 오빠, 누이는 차제하고 형수, 제수, 시누이, 올케,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더 나아가 고종과 이종에 사돈의 8촌, 당숙까지 외우기에도 어지러울 정도지만 단어 하나 들으면 그 관계가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아주 세밀하다.
우리말은 표현의 어휘가 참으로 다양하다. 같은 빨간색이라도 새빨간, 짙빨간, 붉은, 불그스름, 불그스레 등 수 없이 많다. 가족관계 호칭은 또 어떤가? 형과 동생, 오빠, 누이는 차제하고 형수, 제수, 시누이, 올케,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더 나아가 고종과 이종에 사돈의 8촌, 당숙까지 외우기에도 어지러울 정도지만 단어 하나 들으면 그 관계가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아주 세밀하다.
헌데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이런 우리말에도 없는 말이 하나 있다. 아내 잃은 남편은 홀아비, 남편 잃은 아내는 과부, 부모 잃은 자식은 고아라고 하지만 자식 잃은 부모를 일컫는 단어 말이다.
왜일까? 이는 그 슬픔이 너무나도 크고 비참한 심정을 형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비록 그런 부모를 일컫는 단어는 없다 해도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으니 바로 ‘참척의 고통’이다. 참혹할 참(慘), 슬플 척(慽), ‘너무나도 참혹하고 슬픈 감정’이란 뜻이다.
이런 ‘참척의 고통’을 일기로 써 책을 낸 이가 고(故) 박완서 작가다. 1988년 여름, 26세의 아들을 잃었다. 하나 밖에 없는 젊은 의사였던 아들을 잃은 극한의 슬픔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그녀는 통곡하며 하느님을 부정하고 포악과 저주까지 퍼부었다.
‘자식을 앞세우고도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처넣는 에미를 생각하니 징그러워서 토할 것 같았다. 격렬한 토악질이 치밀어 아침에 먹은 걸 깨끗이 토해냈다.’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내 아들이 없는데 세상과 내가 어찌 화해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 대한 미움만 커져갔다.
부산 딸네 집에 내려와 머물던 박완서 작가가 거의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술에 수면제를 타서 먹을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었을 때 이해인 수녀가 찾아와 권유한 대로 수녀원에 잠시 들어간다.
‘그래, 나는 주님과 한번 맞붙어보기로 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하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하느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그럼 하느님도 아니지요.’ ‘하느님이란 그럴 수도 있는 분인가? 사랑 그 자체란 하느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아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신(神)에 대한 증오도 더욱 커져만 갔다.
‘다시금 맹렬한 포악이 치밀었다. 그저 만만한 건 신이었다.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일백 번 고쳐 죽여도 죽을 여지가 남아 있는 신(神),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살의(殺意), 내 살의를 위해서도 당신은 있어야 한다. 암 있어야 하구말구’ 라고 울부짖었다.
지난 2일 LA 한인타운에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들의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총격 사망한 충격적이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고(故) 박완서 작가는 ‘상(喪)을 당한 이에게 정중한 조문을 하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덕입니다. 그러나 참척을 당한 에미에게 하는 조의는 그게 아무리 조심스럽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위로일지라도 모진 고문이오,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습니다’라며 ‘참척의 고통’은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이라고까지 표현했다. 감히 조문(弔問)의 말이 찾아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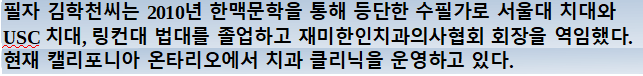
관련기사 [김학천 타임스케치] 대학가 휩쓰는 시위, 무엇을 반대하나
관련기사 [김학천 타임스케치] 기업 사냥꾼과 하이브 사태
관련기사 경찰 9명, 죽어가는 아들 지켜만 보고 있었다 ;구급대원도 부르지 않아 전면수사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