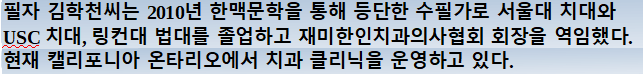필요할 때마다 무분별하게 머릿속의 금을 파내 쓰며 사치와 방탕을 일삼던 그는 급기야 마지막 남은 한 조각 마저 파내고 피를 흘리고 쓰러진다. 이는 절제를 모르는 인간의 탐욕으로 스스로 파괴된다는 알퐁스 도데의 단편소설 이야기다.
헌데 이런 탐욕이 소설을 넘어 아예 인조금까지 만들겠다고 덤벼들었으니 이것이 바로 ‘철학자의 돌’이었다. 중세 사람들은 이 마법의 돌을 발견만 하면 금(金)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에서 엄청난 세월과 지식을 투자했다.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금은 노파도 젊은 여인으로 만들고 창녀도 귀부인으로 만든다’고 했으니 부(富)의 극치를 맛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을 게다.
하지만 결국 그 어느 누구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헌데 아이러니하게도 연금술은 돌이 아닌 종이에서 나왔다. 종이조각 화폐 말이다. 그리고 그 중심엔 미국의 달러가 있다.
스페인이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그야말로 횡재였다. 엄청남 양의 금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이에 군침을 흘린 영국과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함대를 습격해 금들을 탈취해 갔다. 금의 소유가 바로 국가의 부(富)를 상징하던 시절에 금은 전쟁으로 뺏던가 상품을 팔아 그 대금으로 얻는 방법 밖에 없어서다.
허니 신천지로부터 더 많은 양의 금이 스페인으로 들어올수록 더 많은 전쟁과 더 많은 교역을 거쳐 그 금들이 다른 나라들로 흘러 들어갔는데 웬걸 이제 금은 부(富)의 보장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헌데 이 같은 일이 1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서도 일어났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에 전쟁 물자를 팔고 그 대금을 금으로 받았다. 금본위 시대였으므로 이에 따라 돈이 더 많이 발행되어 화폐량은 많아지고 전쟁으로 경제가 침체되는 가운데 생산은 줄어들면서 마침내 대공황을 맞은 거다. 이런 쓰라린 경험을 실감한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제도(FRB), 연준이 통제나 간섭 없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독립이 필요하다고 절감하고 연방정부로부터 분리시켰다. 이렇게 독립된 연준의 종이 연금술은 미국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게 된다.
미국이 맨해튼을 인디언에게서 단돈 24불에 살 때만해도 화폐가 없었으므로 대신 그 가치에 상응하는 것으로 치루는 물물교환 형식이었다.

그러다가 독립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대륙의회가 발행한 최초의 식민지 유가증권이 미국 지폐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는 전쟁으로 효용가치가 없는데다가 관장하는 은행마저 없고 단지 후에 갚겠다는 식민지 정부의 약속만 있는 일종의 신용담보인 셈이었다. 그러자 영국은 신용을 전제로 한 이런 화폐의 개념때문에 금본위제가 와해될까 우려해 식민지 정부의 화폐발행을 금지하게 되니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독립전쟁의 한 원인이 되었다.
결국 독립전쟁에서 이긴 미국의 해밀턴 재무장관은 벼르던 제1 중앙은행을 설립했으나 은행가들의 횡포가 커지면서 이에 맞선 민중과의 마찰로 문을 닫아야 했다. 1816년에 다시 제2은행이 열렸지만 또 다시 폐쇄하기에 이른다. 이후 은행 통제방식에 대한 많은 격론을 거친 끝에 마침내 1913년 제3의 중앙은행이 탄생한다. 이것이 하나가 아닌 1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이사회에서 관장하는 연방준비은행제도(FRB), 연준이다.
독립 전부터 금본위보다는 신용본위가 더 중요함을 인식한 미국은 이후 대공황을 거치면서 은행을 세분해 재정립하고 금본위 제도와 결별한다. 이로써 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 들어선 달러가 마법의 연금술로 막강한 세계의 주인 노릇을 하기에 이른 거다.
하지만 1970년대 미국 경제는 암울했다. 베트남과의 전쟁에 전비를 조달하느라 돈을 많이 발행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데다 원유파동까지 닥쳤다. 당시 연준 의장은 아서 번즈였는데 금리 인상을 피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을 선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13.3%까지 치솟고 30년대 대공황으로 다시 빠질거라는 비관론까지 나올 정도로 미국 경제는 최악이었다.
 이런 위기에서 연준 의장에 폴 볼커가 등장했다. 그는 물가 잡기냐 경기부양이냐는 두 마리 토끼 중 물가 잡기를 택하면서 무려 최대 20%가 넘는 고금리를 감행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노조는 와해되고 볼커 의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나와 권총을 지니고 다녀야 할 정도였지만 그는 눈 하나 꿈적하지 않았다. 급기야 고금리 반대는 일반인들에게서 대통령까지 이어져 12개의 연준에서조차 고금리인하의 요구가 나왔으나 이사회에서 거절했다.
이런 위기에서 연준 의장에 폴 볼커가 등장했다. 그는 물가 잡기냐 경기부양이냐는 두 마리 토끼 중 물가 잡기를 택하면서 무려 최대 20%가 넘는 고금리를 감행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노조는 와해되고 볼커 의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나와 권총을 지니고 다녀야 할 정도였지만 그는 눈 하나 꿈적하지 않았다. 급기야 고금리 반대는 일반인들에게서 대통령까지 이어져 12개의 연준에서조차 고금리인하의 요구가 나왔으나 이사회에서 거절했다.
결국 그의 고집스런 신념으로 강력한 정책이 남긴 후유증은 컸지만 그 후 미국은 40년간 인플레이션의 공포에서 벗어나 경제력을 회복하고 후임자였던 그린스펀은 이를 기반으로 미국 경제를 경쟁력있게 이끌수 있었던 거다. 볼커는 키가2미터라는데 그 키 값을 한 것일까?
그러고 보니 우연이겠지만 역대 연준 의장의 키와 금리 수준에 묘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고금리를 단행한 2 미터의 볼커 의장에 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던 벤 버냉키와 재닛 옐런 전 의장의 키가 평균보다 적었으니 지금의 파월 의장의 키로 볼 때 볼커와 그린스펀 사이의 금리 인상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서다.
지난 주 연준은 지난 달에 이어 두 달 연속 0.75%p, 자이언트스텝 인상을 단행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올해 초 제로금리였던 기준금리를 네 차례 인상하는 초강수로 기준금리는 현행 1.50∼1.75% 수준에서 2.25∼2.5% 수준으로 오르고 연말엔 3.3%가 될 거라고 한다.
이에 따라 각국 화폐 대비 달러 가치가 치솟고 있다. 그러니 기축통화의 파워를 넘어 이제 ‘킹 달러’ 시대로 간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다. 모두가 원하는 돈, ‘달러’의 연금술 파워를 절감하게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