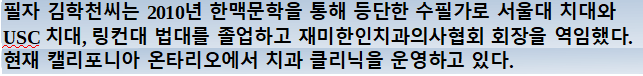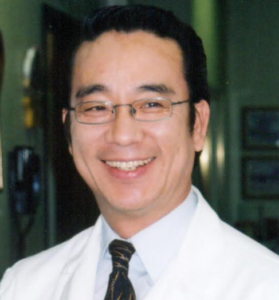 2008년 블룸버그에 스티브 잡스의 부고기사가 나오자 세계 금융 시장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다. 하지만 오보였다. 2005년에는 유럽의 한 방송사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부고 기사를 실수로 인터넷에 올려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레이건 전 대통령, 배우 커크 더글라스,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거물 투자자 조지 소로스 등 멀쩡한 사람의 부고기사 오보 해프닝이 종종 일어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다.
2008년 블룸버그에 스티브 잡스의 부고기사가 나오자 세계 금융 시장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다. 하지만 오보였다. 2005년에는 유럽의 한 방송사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부고 기사를 실수로 인터넷에 올려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레이건 전 대통령, 배우 커크 더글라스,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거물 투자자 조지 소로스 등 멀쩡한 사람의 부고기사 오보 해프닝이 종종 일어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다.
이와는 달리 오보는 아니었지만 묘한 부고기사도 있었다. 2011년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세상을 뜨자 NYT 1면에 부고기사가 나왔다. 신문 4면 분량의 방대한 기사였는데 그 내용이 워낙 충실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헌데 놀라운 것은 그 기사를 쓴 사람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보다 이미 6년 전에 사망한 평론가이자 영화 전문기자였던 것이었다. 그녀가 사망할 것에 대비해 기사를 미리 써뒀던 것인데 정작 기사의 주인공보다 기사 작성자가 먼저 사망한 셈이다.
이러한 일은 죽음이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언론사가 통상 유명인의 부고 기사를 미리 준비했다가 사망하게 되면 바로 출고하는 관행 때문이다. 아예 부고 편집팀을 수시로 꾸려 부고를 미리 쓰는 언론사도 있다.
특히 영미권 언론사는 부고 기사에 각별한 정성으로 다룰뿐만 아니라 대상이 되는 인물의 삶을 젊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수십 년 간을 꾸준히 작성해 모아두었다가 부고 기사를 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저명인사의 부고 기사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 고인이 남긴 업적을 신속하게 조명하고 평가한다. 말하자면 작은 자서전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저명인사의 부고기사에 찬사만 늘어놓진 않는다. 그런 면에선 특히 NYT의 부고가 아주 엄격하다. 고인(故人)의 업적을 칭송 하는 것 외에 잘못까지도 신랄하게 지적한다. 그런 NYT가1851년 창간호부터 2016년까지165년 간 게재된 부고 기사를 엄선해 ‘NYT 부고 모음집’을 펴낸 적도 있는데 책 서문에서 ‘NYT의 부고기사 부서는 가장 뛰어난 기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며 자긍심을 보였다.
지난달 29일 외교의 거목 헨리 키신저가 별세했다. 역시 NYT는 그의 부고를 무려 8면에 걸쳐 실었다. 키신저의 ‘미니 전기’인 셈인데 대부분을 기자 생활 30년 동안 키신저를 꾸준히 만나며 취재한 외교 전문 기자 데이비드 생어가 썼다.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존중에서 가능한 전통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부고가 그런 저명인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부고기자로 유명한WSJ의 40년 관록의 제임스 해거티는 지금까지 1000여건이 넘게 부고기사를 쓰면서 평범한 이들의 죽음에서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발굴해 내 세상에 알렸다.
그는 자신의 저서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가 된다’에서 ‘불의의 사고와 나쁜 소식으로만 가득한 신문만 보고 세상을 읽는다면 이 세상은 비관론자로 가득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 그러한 기사들을 읽은 뒤 부고란을 보라고 권한다.
그 이유는 그 기사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겪었음에도 잘 견뎌낸 삶을 만나게 되면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고의 ‘반면교사’란 말이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자신의 부고를 미리 써보라고 권한다. 그것은 유가족이 고인을 사랑한다 해도 당신 인생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 ‘내 부고를 나보다 잘 쓸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나라 시성 두보의 시 중에 ‘개관사정(蓋棺事定)’이란 말이 있다. ‘사람은 관 뚜껑을 덮은 뒤에라야 비로소 그 면모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평범한 삶도 부고를 쓸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임스 해거티는 ‘내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 지가 아니고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가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