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유명한 낙서 중 하나로 ‘킬로이 다녀감(Kilroy was here)’이 있다.
엄청나게 코가 큰 캐릭터가 코는 벽에 걸쳐 아래로 늘어뜨리고 민머리만 살짝 내밀면서 양손을 담벼락에 걸친 모습과 함께 써있는 글귀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군들이 점령지마다 그린 게 최초라고 하는데 나중에 오는 병사들을 약올리기 위해 ‘여기는 킬로이가 먼저 접수했음’ 하고 남기는 표식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미 본토로 돌아온 군인들에게서 일반인들로까지 재미로 퍼져나가면서 국민적 아이콘으로 굳혀졌다고 하는 낙서다. 한국에도 그 자취가 남아있다고 한다.
낙서는 고대 동굴의 벽화나 이집트의 유적에서 볼 수 있는 그림 등에서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원이 오랜데 그 종류 또한 간단한 스크래치(Scratch)부터 정교한 벽화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
그 중 특히 현대의 스프레이 등을 사용한 ‘그래피티(Graffiti)’라 불리는 낙서는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건물 벽면이나 구조물에 그려진 낙서그림, 낙서화 중 어떤 것은 촌철살인적인 짧은 문장과 함께 단지 낙서라고 치부하기에는 깊이가 있는 어떤 예술적 가치나 철학적 의미를 보이는 것들도 많다.
그래서 그런가? 낙서가 아니라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받아 유럽에서는 이미 ‘거리의 예술(Street Art)’로도 자리잡았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얼굴 없는 거리의 화가’로 불리는 뱅크시(Banksy)가 있다. 장소와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는 주로 기존 권위에 대항하며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때로는 재치 있게 때로는 혹독하게 풍자하는 도발적인 작품들로 게릴라 아티스트 혹은 아트 테러리스트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의 작품의 가격은 각각 다르지만 보통 수십만불 대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다른 한편으로 낙서는 간혹 그 도(度)를 넘어 문화예술을 훼손하거나 파괴해 ‘반달리즘(Vandalism)’으로 비판 받기도 한다.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불길에 휩싸였다. 헤로스트라투스란 사람이 나쁜 짓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며 지른 불로 신전은 겨우 기둥 하나만 남는 처지가 됐다. 반달리즘의 시초다.
반달리즘이란 말은 5세기 고대 게르만족의 한 일파인 반달족이 서로마제국을 침공하면서 각종 문화유산을 무자비하게 파괴했다는 헛소문에서 유래됐다.
유럽인들이 로마를 침공한 반달족을 문화파괴자이자 약탈자로 여겼기 때문인데 사실 그들은 로마문화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잘 받아들였으며 문화재를 파괴하지 않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반달족보다는 오히려 르네상스인들이 더 많이 훼손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무장단체들이나 침략자들에 의한 반달리즘은 종종 일어났으며 지각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기도 한다. 이집트의 룩소르 신전, 이탈리아 피렌체 두오모 대성당 등 세계 곳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발생한다.

헌데 지난 16일, 우리의 대표적 문화유산 경복궁 담장이 스프레이 낙서 테러를 당했다. 경복궁은 창덕궁과 함께 조선 왕조를 대표하는 궁궐, 즉 법궁(法宮)으로 온갖 수난을 다 겪어왔다.
일제(日帝)가 이곳의 건축물들을 해체하거나 훼손해 10%도 안될 정도로만 남았었다. 무려 50여년이 흘러서야 경복궁 복원이 시작되어 이제 그 1차 작업이 끝났고 2045년까지 2차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벌어진 낙서 테러.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건 ‘문화 테러’이자 그래피티는 고사하고 낙서의 축에도 들지 못하는 파렴치한 범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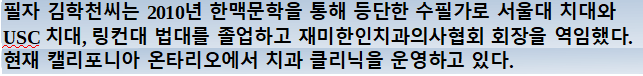
이전 칼럼 [김학천 타임스케치] 고려, 거란을 물리치다 우리가 Korea인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