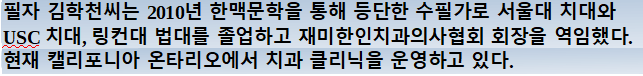미국 남성들에게 선망하는 3대 직업을 꼽으라면 스포츠 팀 감독, 해군 제독 그리고 오케스트라 지휘자라 한다. 손짓 하나로 모든 걸 콘트롤할 수 있는 절대 권한과 최고의 자부심을 가진 대원들을 통솔해 내는 성취감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 남성들에게 선망하는 3대 직업을 꼽으라면 스포츠 팀 감독, 해군 제독 그리고 오케스트라 지휘자라 한다. 손짓 하나로 모든 걸 콘트롤할 수 있는 절대 권한과 최고의 자부심을 가진 대원들을 통솔해 내는 성취감 때문이라고 한다.
이 중에 오케스트라 지휘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과 10g 정도 남짓한 지휘봉 하나로 많은 관중들 앞에서 온갖 화음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무소불위 권위를 휘두르는 지위가 그 어디에도 비할바가 아니어서일테다. 해서 ‘마에스트로 (거장)’라 부르는 거다.
헌데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세계적 추세와 다르게 아직도 여성에게 두터운 장벽 중 하나가 바로 클래식 음악계다.
특히 유럽이 더 그랬다. 여성 첼로 연주자의 자세가 선정적이라고 비난했는가 하면 속치마가 보이면 연주가 시작되는지 알 수 있다는 등의 비아냥도 서슴치 않았으며 여성 밑에서 노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수가 무대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관객이 공연 중 야유하고 환불을 요구하며 난리를 벌인 적도 있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남성에게만 붙이던 마에스트로 호칭이 여성 지휘자들에게 오기까지에는 수많은 그들의 노력과 눈물이 있었다. 뉴욕 필하모닉은 1966년까지 여성 단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특히 ‘여성이 들기에 가장 무거운 것이 지휘봉’이라는 농담만큼이나 지휘 부문의 여성 차별은 더욱 심했다.
베를린 필도 1982년에서야 여성을 제1 바이올린 정단원으로 처음 뽑았으며 얼마 전까지도 중요한 공연에 여성 연주자 지명은 별로 없었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또한 처음으로 여성단원을 받아들인 게 25년 전이고 여성에게 지휘를 맡긴 게 불과 17년 전이다.

이런 남성전유의 음악계에 90여년전 당찬 도전장을 내고 투쟁해 클래식 음악사 최초로 베를린 필과 샌프란시스코 교향악단을 지휘하게 되었던 안토니아 브리코조차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끝내 제대로 된 교향악단에 정식 채용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 밑에서 노래할 수 없다’는 항의에 메트로폴리탄에서 해고되는 아픔도 겪어야 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두 명의 여우주연상 후보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앳원스(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양자경과 ‘타르(Tar)’의 케이트 블란쳇이다. 헌데 이 두 영화의 주인공 캐릭터가 원래는 남자로 설정되었던 작품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작품이 됐을 지도 모를 것이 두 여배우를 통해 질적으로 다른 작품으로 재탄생된 셈이다.

이 중 ‘타르’는 베를린 필하모닉 최초의 여성지휘자로 성공했지만 이 후 폭력적인 남성 권력자와 다를바 없는 모습을 답습하면서 최고의 정점에서 점차 몰락해가는 여성 음악가의 이야기인데 그녀는 자신이 ‘마에스트로(Maestro)’이지 ‘마에스트라 (Maestra)’가 아니라고 역설한다. 해서 타르는 남성과 동등하기 위해서 남성 지위의 권위를 쟁취함으써 이제 시대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타르가 보인 것은 전통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남성 지휘자를 흉내낸 것에 불과할 뿐 결국 진정한 성 평등 의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남성을 닮아야만 동등한 것은 아닐텐데 말이다.
안토니아 브리코는 영화 ‘콘닥터’에서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눈을 감고 음악만 들으면 지휘자가 여자라는 걸 알아채지 못할 것’ 이라고. 남성, 여성이 아니고 그냥 지휘자란 말이다.
마침 지난 8일이 세계여성의 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