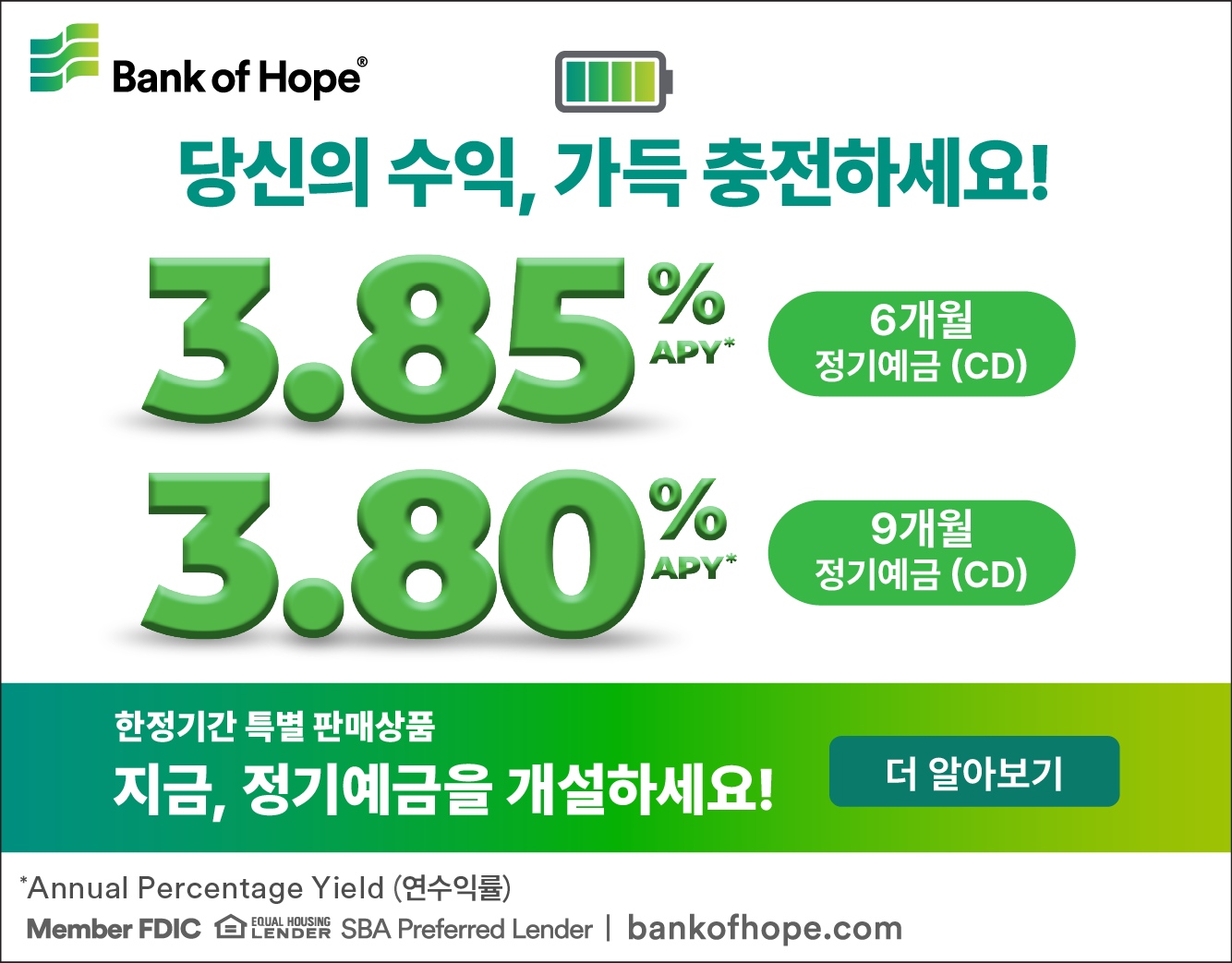북한이 ‘새로운 사고’를 전제로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열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노딜로 끝났던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주목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9일 담화에서 미국을 겨냥,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라며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백악관으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북한에 ‘러브콜’을 보냈다. 취임 첫날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를 언급하는가 하면,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가능성도 부정하지 않았다.
북한의 반응은 무응답에 가까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간의 구애에 미사일 시험발사 내지 핵무기 연구소 시찰 등 행보로 대응했고, 지난달에는 북한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김 부부장이 미국과의 접촉 출로를 거론하면서 그간 동력 없이 표류하던 북미 대화의 진전 가능성이 점쳐진다. 백악관은 김 부부장 담화 직후 로이터에 성명을 보내 비핵화를 전제로 김정은 위원장과 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목할 부분은 대화의 의제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북한과 미국을 ‘핵을 보유한 두 국가’로 칭했는데, 북한을 개별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핵 보유를 전제로 군축 중심의 회담을 하자는 조건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백악관의 이날 성명에는 ‘완전히 비핵화된 북한’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북한과의 대화에는 열려 있되 그간 미국의 대북 정책 근간이었던 비핵화 목표는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을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며 “외부에서 공개되는 이야기를 통해 협상의 의제와 주도권을 두고 다툼이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미가 샅바싸움을 시작했다고 해도 실제 대화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노딜의 트라우마로 인해 사전에 제시한 조건을 수반하지 않은 대미 대화에는 쉬이 나서지 않을 공산이 크다.
반면 미국의 경우 북한이 거론한 대로 ‘핵을 보유한 두 국가’를 전제로 협상을 시작하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핵보유국으로서 자국의 세계적 패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는 1기 행정부 시절 세 차례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며 친분을 과시했고, 이 과정에서 핵 동결 내지 군축 등을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는 ‘스몰 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무엇보다 즉흥적이고 통제받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대북 문제를 좌우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그가 북한과의 담판으로 노벨평화상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정상회담은 가능성 있는 미래라는 게 중론이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무관심을 겪은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 집권 기간을 대화와 제재 해제의 유일한 기회로 여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자체는 정치적 이점이 있다. 특히 재선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년을 전후로 레임덕을 맞을 수 있는데, 북한과의 정상회담은 해당 시점에 국내외적 건재를 보여줄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일련의 상황하에 한국이 우려할 부분은 ‘패싱’ 가능성이다. 북한은 전날 김여정 부부장의 또 다른 담화를 통해 한국과의 관계가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라며 남북 간 논의할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이 중재하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하는 2018년 사례를 재현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한미 정상도 아직 못 만난 상황에서 자칫 우리 안보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북미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을 바라만 보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만 북미 간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의 본질은 스몰딜,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다음 단계’를 담보할 외교적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했다
K-News L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