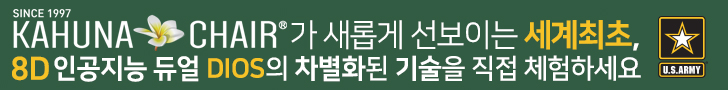지칠 줄 모르고 심술만 부린던 폭염도 한풀 꺽인 듯 열기가 가라앉고 이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10월을 맞이했다. 낮게 기울어 길어진 햇살 속에서 그림자는 부드럽게 늘어나고 마음도 그만큼 길게 숨을 쉰다. 세상이 고요함을 천천히 배워가는 달이다.
그러는 가운데 나뭇잎은 서서히 빛을 잃고 있지만 가장 깊은 색을 낸다. 무언가를 잃으면서도 아름다워지는 즉, 사라짐 속에서 본질이 드러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10월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살아가는 방식이다. 시드는 꽃이 아니라, 다시 피기 위해 잠시 눈을 감는 순간이란 것을.
그러니 우리의 10월은 ‘이별의 계절’이 아니라 ‘마음이 깊어지는 계절’인 거다. 시인 김현승은 ‘10월의 시’에서, 가을은 신앙처럼 침묵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이라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고 했고, 윤동주는 별빛에 기대며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았듯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에도 인생의 호흡을 본다고 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10월은 ‘서늘한 바람’ 속의 ‘정갈한 슬픔’이 살짝 깃들어있다. 해서 시인 박목월은 낙엽 사이에 그리움을 접었다고 했는가 보다.
우리 선조들은 10월을 ‘추월(秋月)’이라 불렀다. 수확을 마무리하고 마음을 거두는 달이란 뜻으로 이 또한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마음이 익어가는 시간의 터득인 거다.
서양의 10월은 조금 다르다. 존 키츠(John Keats)는 ’가을에게’에서 안개와 과실의 계절을 찬미하며 소멸 속에서도 생의 완전함을 찾아냈다. 브래드버리(Ray Bradbury) 또한 그의 단편집에서 어둠 속 인간의 내면을 드러다보고 ‘죽음이 아닌 익어감의 서정’을 이야기했다. 이는 10월이 ‘끝의 시작’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듯 동서양의 정서는 다른 듯하지만 서로 닮아 있다. 한국의 10월이 ‘그리움과 기다림’을 말하고 서양의 10월은 ‘완성과 성숙’을 의미하지만 결국 두 정서는 ‘익어감’이라는 한 단어로 만나는 셈이다.

그리고 그 정서를 음악이 더욱 깊게 해준다. 창가로 흩날리는 낙엽을 보고 닐 영(Neil Young)은 ‘낙엽이 붉고 황금빛으로 흩날리듯, 기억도 천천히 우리 곁을 스쳐간다’고 했으며 누군가는 ‘나무가 잎을 벗듯, 우리 또한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다. 그것이 10월의 침묵이 가르쳐주는 성숙이다’라고 노래했다.
북미 원주민 이로쿼이족(Iroquois)은 10월을 ‘낙엽의 달’이라 부른다.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연의 순환 속에서 성찰과 감사를 배웠기 때문이다. 떨어지는 잎 하나에도 생의 리듬이 깃들어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
이렇듯 동서고금의 언어는 서로 달라도 모두가 이 계절에 같은 것을 느낀다. 한마디로 ‘비움 속의 충만, 사라짐 속의 희망’인 것이니 10월은 떠나기 위한 달이 아니라, 익어가기 위한 달인 거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그 익어감을 작은 희망으로 느끼게 될거다. 가을 햇살 한 줌,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 스치는 사람의 미소 속에서 10월은 삶의 온기를 약속해 준다.
한 마디로, ‘떨어지는 낙엽은 끝이 아니라, 새 봄을 위한 준비다’라는 고향의 햇살처럼 따뜻한 이 한 줄의 글은 우리에게 아주 낯설지 않다.
그것은 우리의 정겨운 노래 때문이다. 햇살과 바람, 그리움과 감사가 함께 흐르는 노래, 바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가 바로 그것이다. ‘눈부신 아침 햇살 속에, 너를 사랑해’ 이 노래의 첫 구절처럼 그 따스한 음성은 속삭인다. ‘10월은 헤어짐의 계절이 아니라, 사랑과 삶이 다시 익어가는 시간’이라고.
이러한 10월에 들어서서 한 남자가 혹은 한 여자가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거닐고 싶다’는 그 노래처럼 모두에게 이 10월이 그 이름만큼이나 ‘멋진 날들’로 기억되었으면 한다.